| J Korean Dent Assoc > Volume 63(6); 2025 > Article |
|
Abstract
Several possible causes for the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have been proposed, but trauma to the jaw including macro and micro-trauma is the most common etiologic factor contributing to a change in biomechanics in the joint. Facial asymmetry is a factor of the force imbalance to the temporomandibular joint which can cause the temporomandiular joint disorders. It can be corrected by orthognatic surgery (2-jaw surgery) with orthodontic therapy to be a harmonic bite force transmission to the temporomandibular joint. And nonfunctional chewing force can be managed with a biofeedback device which is one of the behavior therapies. Biofeedback is a well-proved treatment method in rehabilitation therapy. In the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field, it can alert patients to their bruxing habits in real time and manage to stop the bruxism with stimulation to the patients. In this paper, we report on the 3 cases to discuss about the force management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involved with facial asymmetry and sleep bruxism.
2024ļģä Ļ▒┤Ļ░Ģļ│┤ĒŚśņŗ¼ņé¼ĒÅēĻ░ĆņøÉ ņ¦łļ│æ ņäĖļČäļźś ĒåĄĻ│äņŚÉ ļö░ļź┤ļ®┤ Ēä▒Ļ┤ĆņĀł ņ¦łĒÖśņ£╝ļĪ£ ņ¦äļŻīļź╝ ļ░øņØĆ ĒÖśņ×ÉļŖö 542,735ļ¬ģņ£╝ļĪ£ 2014ļģä 338,287ļ¬ģņŚÉ ļ╣äĒĢ┤ 60.4% ļŖśņŚłļŗż. Ē¢źĒøä Ēä▒Ļ┤ĆņĀł ĒÖśņ×ÉļŖö ļŹö ņ”ØĻ░ĆĒĢĀ Ļ▓āņ£╝ļĪ£ ņČöņĀĢļÉśļ®░ ņ╣śĻ│╝Ļ│äņŚÉņä£ ĒÖ£ļ░£Ē׳ ņ╣śļŻīĒĢ┤ņĢ╝ĒĢśļŖö ņśüņŚŁņØ╝ Ļ▓āņØ┤ļŗż. ņØ┤ļ¤¼ĒĢ£ Ēä▒Ļ┤ĆņĀł ņ¦łĒÖśņØś ņøÉņØĖņØĆ ļŗżņ¢æĒĢśļ®░, ņäĀņ▓£ņĀüņØĖ ņÜöņåīņÖĆ Ēøäņ▓£ņĀüņØĖ ņÜöņØĖņØä ļ¬©ļæÉ ļŗż ĒżĒĢ©ĒĢ£ļŗżĻ│Ā ņĢīļĀżņĀĖ ņ׳ļŗż[1-5]. ļŗżņ¢æĒĢ£ ņøÉņØĖņ£╝ļĪ£ ņØĖĒĢ┤ Ēä▒Ļ┤ĆņĀł ĒÖśņ×Éļź╝ ņ╣śļŻīĒĢśļŗż ļ│┤ļ®┤ ņל ļé½ņ¦Ć ņĢŖņØĆ Ļ▓ĮņÜ░ļÅä ņ׳Ļ│Ā ļŗ╣ņŗ£ņŚÉļŖö Ļ┤£ņ░«ņĢäņĪīļŗżĻ░ĆļÅä ļŗżņŗ£ ņ×¼ļ░£ĒĢśļŖö Ļ▓ĮĒ¢źņØ┤ ņ׳ņ¢┤ ņ×äņāüĻ░ĆļōżņØ┤ ņ¦äļŻīņŚÉ ņ¢┤ļĀżņøĆņØä Ļ░Ćņ¦ĆĻĖ░ļÅä ĒĢ£ļŗż. Ēä▒Ļ┤ĆņĀłņØĆ ņĀĆņ×æĻ│╝ ĻĄÉĒĢ®ņŚÉ ņØśĒĢ£ ĒלņŚÉ ņśüĒ¢źņØä ļ░øņ£╝ļ®░ Ēä▒Ļ┤ĆņĀłņŚÉ Ļ░ĆĒĢ┤ņ¦ĆļŖö Ļ│╝ļÅäĒĢ£ ĒלņØĆ ņŚ¼ļ¤¼ Ļ░Ćņ¦Ć Ēä▒Ļ┤ĆņĀł ņ¦łĒÖśņØä ņĢ╝ĻĖ░ĒĢ£ļŗż[6-10]. ĒĢśņĢģĻ│©ņØś ĒśĢĒā£ĒĢÖņĀüņØĖ ļ¼ĖņĀ£ļĪ£ ņØĖĒĢ┤ Ļ┤ĆņĀłļČĆņŚÉ Ļ░ĆĒĢ┤ņ¦ĆļŖö ĒĢśņżæņØś ņ”ØĻ░ĆļŖö Ēä▒Ļ┤ĆņĀł ņ¦łĒÖśņØä ņØ╝ņ£╝ĒéżļŖöļŹ░ ņŻ╝ņÜöĒĢ£ ņøÉņØĖ ņżæņŚÉ ĒĢśļéśļĪ£ ņ¢ĖĻĖēļÉśļ®░, ņĀ£2ĻĖē ļČĆņĀĢĻĄÉĒĢ®ņØä ļ╣äļĪ»ĒĢ£ Ļ│©Ļ▓®ņä▒ ļČĆņĀĢĻĄÉĒĢ® ļ░Å ņĢłļ®┤ļ╣äļīĆņ╣ŁņØś Ļ▓ĮņÜ░ņŚÉ Ēä▒Ļ┤ĆņĀł ņ¦łĒÖśņ£╝ļĪ£ ņ¦äĒ¢ēļÉśļŖö Ļ▓āņØ┤ ļ│┤Ļ│ĀļÉ£ļŗż[11,12]. ņØ┤ļ¤¼ĒĢ£ Ļ│©Ļ▓®ņĀüņØĖ ļ¼ĖņĀ£ ņØ┤ņÖĖņŚÉļÅä ņĪ░ņĀłļÉśņ¦Ć ņĢŖņØĆ ņĀĆņ×æļĀźņØĆ ņĀĆņ×æĻĘ╝ņØś ĒåĄņ”ØĻ│╝ Ēä▒Ļ┤ĆņĀłņ”Ø, Ēä▒Ļ┤ĆņĀłņŚ╝ņØä ļ░£ņāØņŗ£Ēé¼ ņłś ņ׳ļŗż. ņןĻĖ░Ļ░äņŚÉ Ļ▒Ėņ│É Ļ┤ĆņĀłĻ│╝ ņĀĆņ×æĻĘ╝ņŚÉ Ļ░ĆĒĢ┤ņ¦ĆļŖö Ļ▓Įļ»ĖĒĢśĻ│Ā ļ╣łļ▓łĒĢśļ®░ ļ░śļ│ĄņĀüņØĖ ĒלņØĆ ļ╣äĻĖ░ļŖźņĀüņØĖ ņĀĆņ×æļĀźņØ┤ļŗż. ņØ┤ļ¤¼ĒĢ£ ļ»ĖņäĖņÖĖņāüņØś ļīĆĒæ£ņĀüņØĖ ņśłļŖö ņłśļ®┤ ņØ┤Ļ░łņØ┤ļØ╝Ļ│Ā ļ│╝ ņłś ņ׳ļŗż[13-15].
ņØ┤ļ▓ł ļģ╝ļ¼ĖņŚÉņä£ļŖö ņĢłļ®┤ļ╣äļīĆņ╣ŁņØ┤ ņ׳ļŖö ĒÖśņ×ÉņÖĆ ņłśļ®┤ ņØ┤Ļ░łņØ┤Ļ░Ć ņĪ┤ņ×¼ĒĢśļŖö ĒÖśņ×Éļź╝ ĒåĄĒĢ┤ Ēä▒Ļ┤ĆņĀłņŚÉ Ļ░ĆĒĢ┤ņ¦ĆļŖö ļ╣äļīĆņ╣Łņ£╝ļĪ£ ņŻ╝ņ¢┤ņ¦ĆļŖö ĻĄÉĒĢ®ļĀźĻ│╝ ļ╣äĻĖ░ļŖźņĀü ņĀĆņ×æļĀźņØ┤ Ēä▒Ļ┤ĆņĀł ņ¦łĒÖśņŚÉ ņ¢┤ļ¢ĀĒĢ£ ņśüĒ¢źņØä ļü╝ņ╣śļŖöņ¦Ć ņé¼ļĪĆļź╝ ĒåĄĒĢ┤ ņĢīņĢäļ│┤Ļ│Āņ×É ĒĢ£ļŗż.
28ņäĖ ņŚ¼ņä▒ņØ┤ ņĢłļ®┤ļ╣äļīĆņ╣ŁĻ│╝ Ēä▒Ļ┤ĆņĀłņØś ļČłĒÄĖĻ░Éņ£╝ļĪ£ ļé┤ņøÉĒĢśņśĆļŗż. ņĢłļ¬©ļŖö ņÜ░ņĖĪņ£╝ļĪ£ ļ╣äļīĆņ╣ŁņØ┤ Ļ┤Ćņ░░ļÉśņŚłņ£╝ļ®░, ņÜ░ņĖĪ Ēä▒Ļ┤ĆņĀłļČĆņ£äņØś Ļ┤ĆņĀłņ×ĪņØīņØ┤ ņ׳ņŚłņ£╝ļ®░ 26mm Ļ░£ĻĄ¼ ņŗ£ Ļ│╝ļæÉĻ▒Ėļ”╝ņØ┤ ņ׳ņŚłļŗż. ņĄ£ļīĆĻ░£ĻĄ¼ļ¤ēņØĆ 48mmņØ┤Ļ│Ā ņÜ░ņĖĪņ£╝ļĪ£ ļ│Ćņ£äļÉ£ Ļ░£ĻĄ¼ ņ¢æņāüņØä ļ│┤ņśĆļŗż. ņĢłļ®┤ CTņÖĆ X-ray ņ┤¼ņśü Ļ▓░Ļ│╝, ņóīņĖĪ ĒĢśņĢģņ¦ĆĻ░Ć ņÜ░ņĖĪ ĒĢśņĢģņ¦ĆņŚÉ ļ╣äĒĢ┤ 12.89mm ĻĖĖņŚłņ£╝ļ®░ Ļ┤ĆņĀłĻ╣īņ¦ĆņØś ļ░®Ē¢źņØ┤ ņÜ░ņĖĪ ĒĢśņĢģņ¦ĆņŚÉ ļ╣äĒĢ┤ ņÖĖņĖĪņ£╝ļĪ£ Ē¢źĒĢ┤ ņ׳ļŖö Ļ▓āņØä ņĢī ņłś ņ׳ņŚłļŗż(Fig. 1). ņÜ░ņĖĪ ĒĢśņĢģņ▓┤ņØś ĻĖĖņØ┤Ļ░Ć ņóīņĖĪņŚÉ ļ╣äĒĢ┤ ĻĖĖĻ│Ā ņØ┤ļĪ£ ņØĖĒĢ┤ ĒĢśņĢģ Ēä▒ļüØņØĆ ņĀĢņżæņäĀņŚÉ ļ╣äĒĢ┤ ņÜ░ņĖĪņ£╝ļĪ£ 13.8mm ĒÄĖņ£äļÉśņ¢┤ ņ׳ņŚłļŗż. ĻĘĖļ”¼Ļ│Ā ĻĄÉĒĢ®ĒÅēļ®┤ņØĆ ņóīņĖĪņ£╝ļĪ£ ĻĖ░ņÜĖņ¢┤ņ¦ĆĻ│Ā ĻĄ¼ņ╣śļČĆ ļ░śļīĆĻĄÉĒĢ®Ļ│╝ ņĀäņ╣śļČĆ ņĀłļŗ©ĻĄÉĒĢ®ņØ┤ ņĪ┤ņ×¼ĒĢśņśĆļŗż(Fig. 2). ņĢłļ®┤ļ╣äļīĆņ╣ŁĻ│╝ Ēä▒Ļ┤ĆņĀłņøÉĒīÉņØś ņĀĢļ│Ąņä▒ ņĀäļ░®ļ│Ćņ£äļĪ£ ņ¦äļŗ©ĒĢśĻ│Ā ĒĢśņĢģĻ│©ņØś ļ╣äļīĆņ╣ŁĻ│╝ ĻĄÉĒĢ®ĒÅēļ®┤ņØś Ļ░£ņäĀņØä ņ£äĒĢ┤ Ēä▒ĻĄÉņĀĢņłśņłĀĻ│╝ ņ╣śņĢäĻĄÉņĀĢņłĀņØä Ļ│äĒÜŹĒĢśņśĆļŗż. Ēä▒ĻĄÉņĀĢņłśņłĀņØĆ ņāüņĢģĻ│© Ēøäņāüļ░®(ņóīņĖĪ: 3.5mm, ņÜ░ņĖĪ: 4.5mm)ņØ┤ļÅÖĒĢśĻ│Ā, ĒĢśņĢģĻ│©ņØĆ Ēøäļ░®(ņóīņĖĪ: 17.5mm, ņÜ░ņĖĪ: 5.5mm) ņØ┤ļÅÖĒĢśņśĆļŗż(Fig. 3). Ēä▒ļüØņä▒ĒśĢņłĀĻ│╝ ĒĢśņĢģĻ│© ņ£żĻ│Įņä▒ĒśĢņłĀņØä ĒåĄĒĢ┤ ĒĢśņĢģĻ│©Ļ│╝ ņĢłļ¬©ņØś ļīĆņ╣ŁņŚÉ ļÅäņøĆņØä ņŻ╝ņŚłļŗż. ĒĢśņĢģĻ│©ņłśņłĀņØĆ ņŗ£ ņŗ£ņāüļČäĒĢĀņĀłĻ│©ņłĀņØä ņØ┤ņÜ®ĒĢśņśĆņ£╝ļ®░, Ļ┤ĆņĀłĻ│╝ļæÉĻ░Ć ĒżĒĢ©ļÉ£ ĻĘ╝ņŗ¼Ļ│©ĒÄĖņØä ņ×¼ņ£äņ╣śņŗ£ņ╝£ņŻ╝ņ¢┤ Ļ│╝ļæÉĻ▒Ėļ”╝ņØä ĒĢ┤ņåīĒĢśļĀż ĒĢśņśĆļŗż. ņłśņłĀ 2ņŻ╝Ēøä ņ╣śņĢäĻĄÉņĀĢņłĀņØä ņŗ£ņ×æĒĢśļ®┤ņä£ Ļ░£ĻĄ¼ņŚ░ņŖĄņØä ņ¦äĒ¢ēĒĢśņśĆņ£╝ļ®░ ļ╣äļīĆņ╣ŁņĀü Ļ░£ĻĄ¼ ņŖĄĻ┤ĆņØś ĻĄÉņĀĢņØä ņ£äĒĢ┤ Ēāäņä▒Ļ│Āļ¼┤ņżäņØä ņØ┤ņÜ®ĒĢśņŚ¼ ņżæņŗ¼ņäĀņŚÉ ļ¦×Ļ▓ī ņ¦äĒ¢ēĒĢśņśĆļŗż. ņłśņłĀ 6Ļ░£ņøö Ēøä ĒÅēĻ░Ć ņŗ£, ņĢłļ¬©ņØś ļ╣äļīĆņ╣ŁņØĆ Ļ░£ņäĀļÉ£ Ļ▓░Ļ│╝ļź╝ ļ│┤ņśĆņ£╝ļ®░(Fig. 4) Ēä▒Ļ┤ĆņĀł ļČĆņ£äņØś Ļ│╝ļæÉĻ▒Ėļ”╝ņØĆ Ļ┤Ćņ░░ļÉśņ¦Ć ņĢŖĻ│Ā ņĀĢņāüļ▓öņ£ä ļé┤ņØś Ļ░£ĻĄ¼ ņ¢æņāüņØä ļ│┤ņśĆļŗż.
32ņäĖ ņŚ¼ņä▒ņØ┤ ņÜ░ņĖĪ Ēä▒Ļ┤ĆņĀłņØś ĒåĄņ”ØĻ│╝ Ļ░£ĻĄ¼ņĀ£ĒĢ£ņØä ņŻ╝ņåīļĪ£ ļé┤ņøÉĒĢśņśĆļŗż. ļé┤ņøÉ ņĀäņŚÉ 3ņ░©ļĪĆņŚÉ Ļ▒Ėņ│É Ļ░üĻ░ü ļŗżļźĖ ņØśļŻīĻĖ░Ļ┤ĆņŚÉņä£ Ēä▒ĻĄÉņĀĢņłśņłĀņØä ļ░øņØĆ Ļ▓ĮĒŚśņØ┤ ņ׳Ļ│Ā, ņØīņŗØļ¼╝ ņĀĆņ×æņØ┤ ĒלļōżĻ│Ā ņ×ģņØ┤ ļ╣äļÜżņ¢┤ņĀĖ ņé¼ĒÜīĻ┤ĆĻ│äņŚÉļÅä ļ¼ĖņĀ£Ļ░Ć ņ׳ņŚłļŗż. ņĢłļ¬©ļŖö ņóīņĖĪņ£╝ļĪ£ ļ│Ćņ£äļÉ£ ļ╣äļīĆņ╣ŁņØ┤ Ļ┤Ćņ░░ļÉśņŚłĻ│Ā ĻĄÉĒĢ®ņØĆ ņāüņĢģĻ│©ņØś ņÜ░ņĖĪ ļ│Ćņ£ä, ĒĢśņĢģĻ│©ņØś Ļ▓Įņé¼ņ¦ä ņóīņĖĪ ļ│Ćņ£äļĪ£ ņØĖĒĢ┤ ņ╣śņĢä ņżæņŗ¼ņäĀ ļ╣äļīĆņ╣ŁņØä ĒżĒĢ©ĒĢśņŚ¼ ņĀäņ╣śļČĆņØś Ļ░£ļ░®ĻĄÉĒĢ®Ļ│╝ ĻĄ¼ņ╣śļČĆņØś ļ░śļīĆĻĄÉĒĢ®ņØ┤ Ļ┤Ćņ░░ļÉśņŚłļŗż(Fig. 5). ņÜ░ņĖĪ Ļ┤ĆņĀłļČĆņ£ä ĒåĄņ”ØĻ│╝ ļŗżņłśņØś ņłśņłĀļĪ£ ņØĖĒĢ£ ņĀĆņ×æĻĘ╝ ņŻ╝ņ£ä ņĪ░ņ¦üņØś Ļ▓Įņ¦üņ£╝ļĪ£ ņØĖĒĢ┤ ņ×Éļ░£ņĀü ņĄ£ļīĆĻ░£ĻĄ¼ļ¤ēņØĆ 23mmņØ┤ņŚłļŗż. ĒīīļģĖļØ╝ļ¦łļ░®ņé¼ņäĀņśüņāüņŚÉņä£ ņÜ░ņĖĪ ĒĢśņĢģĻ│╝ļæÉĻ░Ć ņóīņĖĪņŚÉ ļ╣äĒĢ┤ glenoid fossaņ£╝ļĪ£ ļČĆĒä░ ļ¢©ņ¢┤ņĀĖ ņ׳Ļ│Ā ņĀäļ░®ņ£╝ļĪ£ ĻĖ░ņÜĖņ¢┤ņĀĖ ņ׳ļŖö Ļ▓āņØä Ļ┤Ćņ░░ĒĢĀ ņłś ņ׳ņŚłļŗż(Fig. 6). ņØ┤ņĀä ĒĢśņĢģĻ│©ĒÄĖ Ļ│ĀņĀĢņŗ£ ĒĢśņĢģĻ│╝ļæÉĻ░Ć ĒżĒĢ©ļÉ£ ĻĘ╝ņŗ¼Ļ│©ĒÄĖņØ┤ Ēøäļ░®ņ£╝ļĪ£ ņ£äņ╣śĒĢśņŚ¼ Ļ│ĀņĀĢļÉ£ Ļ▓āĻ│╝ ņāüņĢģĻ│©ņØś ņÜ░ņĖĪ ļ│Ćņ£äļÉśņ¢┤ Ļ│ĀņĀĢļÉ£ Ļ▓āņØä Ļ░£ņäĀņŗ£ĒéżĻĖ░ ņ£äĒĢ┤ 4ļ▓łņ¦Ė Ēä▒ĻĄÉņĀĢņ×¼ņłśņłĀ(4th reoperation)Ļ│╝ ņ╣śņĢäĻĄÉņĀĢņłĀņØä Ļ│äĒÜŹĒĢśņśĆļŗż. ņāüņĢģĻ│©ņØś ņłśņłĀ ņŗ£ ĒĢśņĢģĻ│©ņØś ņĢłņĀĢņØä ņ£äĒĢ┤ Ēøäņāüļ░®ņØ┤ļÅÖ 2.5mmņÖĆ ĻĖ░ņÜĖņ¢┤ņ¦ä ĻĄÉĒĢ®ĒÅēļ®┤ņØś Ļ░£ņäĀņØä ņ£äĒĢ┤ ĻĄÉĒĢ®ĒÅēļ®┤ ņłśņĀĢ1.5mmļź╝ ĒĢśņśĆņ£╝ļ®░ ļÅÖņŗ£ņŚÉ ņāüņĢģņØś ļ╣äļīĆņ╣Ł Ļ░£ņäĀņØä ņ£äĒĢ┤ ņóīņĖĪņ£╝ļĪ£ 1.5mm ņĖĪļ░®ņØ┤ļÅÖĒĢśņśĆļŗż. ĒĢśņĢģĻ│©ņØĆ ĻĖ░ņĪ┤ņØś Ļ│©ņĀłņäĀņØä ņØ┤ņÜ®ĒĢśņŚ¼ Ļ│©ĒÄĖņØä ļČäļ”¼ĒĢ£ Ēøä ļ│Ćņ£äļÉ£ ņÜ░ņĖĪ ĻĘ╝ņŗ¼Ļ│©ĒÄĖņØä Ļ┤ĆņĀłņÖĆņŚÉ ņ×¼ņ£äņ╣śņŗ£ĒéżĻ│Ā ņāüņĢģĻ│©ņØś ņ£äņ╣śņŚÉ ļö░ļØ╝ Ļ│ĀņĀĢĒĢśņśĆļŗż. ņłśņłĀ ņżæ ļ╣äļīĆņ╣ŁņØ┤ ĒĢ┤ņåīļÉ£ Ļ▓āĻ│╝ Ļ░£ĻĄ¼ļ¤ē 45mm ĒÖĢļ│┤ļÉ£ Ļ▓āņØä ĒÖĢņØĖĒĢśņśĆļŗż. ņłśņłĀ Ēøä ĒīīļģĖļØ╝ļ¦łļ░®ņé¼ņäĀņśüņāüĻ│╝ 3D CTņśüņāüņŚÉņä£ ņ╣śņĢäņØś ņĀĢņżæņäĀņØ┤ ņØ╝ņ╣śĒĢśĻ│Ā ņĀäņ╣śļČĆ ļ░Å ĻĄ¼ņ╣śļČĆņØś ļ░śļīĆĻĄÉĒĢ®ņØ┤ ĒĢ┤ņåīļÉ£ Ļ▓āņØä ļ│╝ ņłś ņ׳ņŚłļŗż. ĻĘĖļ”¼Ļ│Ā ņÜ░ņĖĪ ĒĢśņĢģĻ│╝ļæÉĻ░Ć Ļ┤ĆņĀłĻ░Ģ ļé┤ ņ×¼ņ£äņ╣śļÉ£ Ļ▓āĻ│╝ ĒĢśņĢģņ¦ĆņØś ļ░®Ē¢źņØ┤ ņóī, ņÜ░ņĖĪ ļ╣äņŖĘĒĢśļŗżļŖö Ļ▓āņØä ĒÖĢņØĖĒĢĀ ņłś ņ׳ņŚłļŗż(Figs. 7 and 8). ņłśņłĀ Ēøä 2ņŻ╝ļČĆĒä░ Ļ░£ĻĄ¼ņŚ░ņŖĄĻ│╝ ņ╣śņĢä ĻĄÉņĀĢņØä ņ¦äĒ¢ēĒĢśņśĆņ£╝ļ®░, ņłśņłĀ Ēøä 3Ļ░£ņøöņŚÉ ņ×Éļ░£ņĀü Ļ░£ĻĄ¼ļ¤ē 35mm ĒÖĢņØĖĒĢśņśĆļŗż. ļŗżņłśņØś ņłśņłĀļĪ£ ņØĖĒĢ£ ĻĄ¼Ļ░Ģļé┤ ļ░śĒØö ņĪ░ņ¦üĻ│╝ ņĀĆņ×æĻĘ╝ ņŻ╝ņ£äņØś Ļ▓ĮĻ▓░Ļ░Éņ£╝ļĪ£ ņØĖĒĢ┤ ņĀüĻĘ╣ņĀüņØĖ Ļ░£ĻĄ¼ĒøłļĀ©ņØä ĒĢśņśĆņ£╝ļ®░ ņłśņłĀ Ēøä 6Ļ░£ņøöņŚÉ 38mmņØś Ļ░£ĻĄ¼ļ¤ēņØä ļ│┤ņśĆņ£╝ļéś ĒåĄņ”ØņØĆ ņŚåĻ│Ā ņØ╝ņāüņŗØņØ┤ Ļ░ĆļŖźĒĢśņŚ¼ ņØ┤ĒøäņØś Ļ▓ĮĻ│╝Ļ┤Ćņ░░ņŚÉļŖö ļé┤ņøÉĒĢśņ¦Ć ņĢŖņĢśļŗż.
24ņäĖ ļé©ņä▒ņØ┤ ņłśļ®┤ ņØ┤Ļ░łņØ┤ļĪ£ ņØĖĒĢ£ ņŗ¼ĒĢ£ ļæÉĒåĄĻ│╝ Ēä▒Ļ┤ĆņĀł ļČĆņ£äņØś ĒåĄņ”ØņØä ņŻ╝ņåīļĪ£ ņØ┤ņĀäņŚÉ ņŖżĒöīļ”░ĒŖĖ ņ╣śļŻī, ļ│┤ĒåĪņŖż ņŻ╝ņé¼ ļō▒ ņŚ¼ļ¤¼ņ░©ļĪĆ ĒāĆņØśļŻīĻĖ░Ļ┤ĆņŚÉņä£ ņ¦äļŻīļź╝ ļ│┤ņĢśņ£╝ļéś ĒĢ┤Ļ▓░ļÉśņ¦Ć ņĢŖņĢśļŗż. ĒåĄņ”ØņØĆ ĻĖ░ņāü ņ¦üĒøäņŚÉ VAS 5-7ņĀĢļÅäņØś ņłśņżĆņ£╝ļĪ£ ņ׳ņŚłņ£╝ļ®░, ņ¢æņĖĪ ņĖĪļæÉļČĆņ£ä ĒåĄņ”ØņØä ļ╣äļĪ»ĒĢśņŚ¼ Ļ░äĒŚÉņĀü Ļ│╝ļæÉĻ▒Ėļ”╝ ņ׳ņ¢┤ ņłśļ®┤ ņØ┤Ļ░łņØ┤ļĪ£ ņØĖĒĢ£ Ēä▒Ļ┤ĆņĀłņøÉĒīÉņØś ņĀĢļ│Ąņä▒ ņĀäļ░®ļ│Ćņ£äņÖĆ ņĀĆņ×æĻĘ╝ņØś ĻĘ╝ļ¦ēļÅÖĒåĄ ņ”ØĒøäĻĄ░ņ£╝ļĪ£ ņ¦äļŗ©ĒĢśņśĆļŗż. ņłśļ®┤ ņØ┤Ļ░łņØ┤ņØś Ļ┤Ćļ”¼ļź╝ ņ£äĒĢ┤ Ē¢ēļÅÖņÜöļ▓Ģ ņżæņŚÉ ĒĢśļéśņØĖ ļ░öņØ┤ņśżĒö╝ļō£ļ░▒ ņןņ╣śļź╝ 6ņŻ╝Ļ░ä ņé¼ņÜ®ĒĢśņŚ¼ ņĀĆņ×æĻĘ╝ņØś ļ╣äĻĖ░ļŖźņĀü ĒÖ£ļÅÖņØä ļ¬©ļŗłĒä░ļ¦üĒĢśĻ│Ā ņŚŁņ╣ś ņØ┤ņāüņØś ņĀĆņ×æĻĘ╝ ĒÖ£ļÅÖņØ┤ Ļ░Éņ¦ĆļÉśļ®┤ ņ¦äļÅÖņØä ĒåĄĒĢśņŚ¼ ļ╣äĻĖ░ļŖźņĀü ņØ┤Ļ░łņØ┤ļź╝ ņĪ░ņĀłĒĢśņśĆļŗż. ļ░öņØ┤ņśżĒö╝ļō£ļ░▒ ņןņ╣ś(Goodeeps┬«, Changwon, Korea)ļź╝ ņĖĪļæÉļČĆņŚÉ ļČĆņ░®ĒĢśņŚ¼ ņĖĪļæÉĻĘ╝ņØś ĒÖ£ņä▒ĒÖö ņĀĢļÅäļź╝ 6ņŻ╝Ļ░ä(ņ┤Ø ņé¼ņÜ®Ēܤņłś: 26ĒÜī, ņ┤Ø ņĖĪņĀĢņŗ£Ļ░ä: 129ņŗ£Ļ░ä 45ļČä)ļÅÖņĢł 470,825,744Ļ░£ņØś ĻĘ╝ņĀäļÅä ļŹ░ņØ┤Ēä░ļź╝ ĒÖĢļ│┤ĒĢśņśĆĻ│Ā, ņØ┤Ļ░łņØ┤ņŚÉ ļ░śņØæĒĢśņŚ¼ ņ¦äļÅÖ Ēö╝ļō£ļ░▒ņØä ņŻ╝ņŚłļŗż. ņé¼ņÜ®ņ┤łĻĖ░ņŚÉļŖö ņ¦äļÅÖ ņ×ÉĻĘ╣ņØä ņżäļ¦īĒü╝ Ļ░ĢĒĢ£ ņĀĆņ×æĻĘ╝ņØś ĒÖ£ļÅÖņØ┤ ņ׳ņŚłĻ│Ā ĒĢśļŻ©ļ░żņŚÉ 4ļ▓łņŚÉņä£ 13ļ▓ł ņĀĢļÅäņØś ļ░öņØ┤ņśż Ēö╝ļō£ļ░▒ Ļ░£ņ×ģņØ┤ ņ׳ņŚłņ£╝ļ®░ ņé¼ņÜ® Ēøä 3ņŻ╝ņ░©ļČĆĒä░ ņ¦äļÅÖņ×ÉĻĘ╣ņØä ņĀ£Ļ│ĄĒĢĀ ļ¦īĒü╝ņØś ņØ┤Ļ░łņØ┤Ļ░Ć ļ░£ņāØĒĢśņ¦Ć ņĢŖņĢśļŗż(Figs. 9 and 10). ņØ┤ļĢīļČĆĒä░ ņ×ĀņŚÉņä£ Ļ╣©ņ¢┤ ļé£ Ēøä ņĖĪļæÉļČĆņ£äņØś ĒåĄņ”ØņØ┤ ļ¦ÄņØ┤ Ļ░ÉņåīĒĢśņśĆļŗżĻ│Ā ĒĢśņśĆņ£╝ļ®░ Ļ░£ĻĄ¼ņŗ£ Ļ▒Ėļ”¼ļŖö ļŖÉļéīļÅä ņżäņŚłļŗżĻ│Ā ĒĢśņśĆļŗż.
Ēä▒Ļ┤ĆņĀłņØä ĒżĒĢ©ĒĢ£ ņĀĆņ×æ ļČĆņ£äņØś ļ╣äņĀĢņāüņĀü ĒĢśņżæņØĆ ņĢłļ®┤ļČĆ ĒåĄņ”ØņØä ļ╣äļĪ»ĒĢśņŚ¼ Ēä▒Ļ┤ĆņĀłņ”Ø, Ļ┤ĆņĀłņŚ╝Ļ│╝ Ļ░ÖņØĆ Ēä▒Ļ┤ĆņĀł ņ¦łĒÖśĻ│╝ ņ╣śņĢä ĒīīņĀł, ļ│┤ņ▓Āļ¼╝ ļ░Å ņ╣śĻ│╝ ņ×äĒöīļ×ĆĒŖĖņØś ĒīīņĀł ļō▒ ņŚ¼ļ¤¼ Ļ░Ćņ¦Ć ļ¼ĖņĀ£ļź╝ ņĢ╝ĻĖ░ĒĢĀ ņłś ņ׳ļŗż. ņØ┤ļ¤¼ĒĢ£ Ēä▒Ļ┤ĆņĀł ņ¦łĒÖśņŚÉ ļīĆĒĢ┤ ļ¬ć Ļ░Ćņ¦Ć Ļ░ĆļŖźĒĢ£ ņøÉņØĖņØ┤ ņĀ£ņĢłļÉśņŚłņ¦Ćļ¦ī ņĪ░ņĀłļÉśņ¦Ć ņĢŖņØĆ ĒלĻ│╝ ņĢłļ®┤ļ╣äļīĆņ╣ŁņØ┤ļéś ļČĆņĀĢĻĄÉĒĢ®Ļ│╝ Ļ░ÖņØĆ Ēä▒ļ╝łņØś ĻĄ¼ņĪ░ņĀü ļ¼ĖņĀ£ļŖö Ļ┤ĆņĀłņØś ņāØņ▓┤ ņŚŁĒĢÖ ļ│ĆĒÖöņŚÉ ĻĖ░ņŚ¼ĒĢśļŖö Ļ░Ćņן ĒØöĒĢ£ ļ│æņØĖĒĢÖņĀü ņÜöņØĖņ£╝ļĪ£ ņāØĻ░üĒĢĀ ņłś ņ׳ļŗż[11]. ņ▓½ ļ▓łņ¦Ė ĒÖśņ×ÉņØś Ļ▓ĮņÜ░, ņóīņĖĪ ĒĢśņĢģņ¦ĆĻ░Ć ņÜ░ņĖĪņŚÉ ļ╣äĒĢ┤ 12.89mm ĻĖĖņŚłĻ│Ā ņØ┤ ņśüĒ¢źņ£╝ļĪ£ ĒĢśņĢģĻ│©ņØś ņżæņŗ¼ņØĆ ņÜ░ņĖĪņ£╝ļĪ£ ĒÄĖņ£äļÉśņ¢┤ ņ׳ņŚłļŗż. ņØ┤ļ¤¼ĒĢ£ Ļ▓ĮņÜ░, ļīĆļČĆļČä ņ¦¦ņØĆ ņ¬Įņ£╝ļĪ£ ĒĢśņżæņØ┤ ļ¦ÄņØ┤ ņĀäļŗ¼ļÉśņ¢┤ Ēä▒Ļ┤ĆņĀł ņ¦łĒÖśņØ┤ ļ░£ņāØĒĢĀ Ļ░ĆļŖźņä▒ņØ┤ ļåÆļŗż. ņØ┤ ĒÖśņ×ÉļŖö ņāüļīĆņĀüņ£╝ļĪ£ ņ¦¦ņØĆ ĒĢśņĢģņ¦Ćļź╝ Ļ░Ćņ¦ä ņÜ░ņĖĪņŚÉ Ļ┤ĆņĀł ņ×ĪņØīņØä ļÅÖļ░śĒĢśņŚ¼ Ļ░äĒŚÉņĀü Ļ│╝ļæÉ Ļ▒Ėļ”╝ņØ┤ ņ׳ņŚłļŗż. Ēä▒Ļ┤ĆņĀłņŚÉ Ļ░ĆĒĢ┤ņ¦ĆļŖö Ļ│╝ĒĢ£ ĒĢśņżæņØĆ Ēä▒Ļ┤ĆņĀł ņøÉĒīÉņØ┤ ņĀäļ░® ļ│Ćņ£äļÉśĻ│Ā ņøÉĒīÉ Ēøäļ░®ņĪ░ņ¦üņŚÉ ĒלņØ┤ Ļ░ĆĒĢ┤ņĀĖ ĒåĄņ”ØĻ│╝ Ļ┤ĆņĀł ņ×ĪņØīņØä ĒżĒĢ©ĒĢ£ Ēä▒Ļ┤ĆņĀłņ”ØņØä ņØ╝ņ£╝Ēé©ļŗż[20]. ĒĢśņ¦Ćļ¦ī ļ╣äļīĆņ╣ŁņØ┤ Ēü¼Ļ▓ī ņĪ┤ņ×¼ĒĢśļŖö Ļ▓ĮņÜ░, ļ░śļō£ņŗ£ ņØ┤ĒÖśņĖĪņŚÉļ¦ī Ēä▒Ļ┤ĆņĀł ņןņĢĀĻ░Ć ņĪ┤ņ×¼ĒĢśļŖö Ļ▓āņØĆ ņĢäļŗīļŹ░, ņØ┤Ļ▓āņØĆ ĒåĄņ”ØņØ┤ļéś ļČłĒÄĖĻ░ÉņØä ĒĢ┤ņåīĒĢśĻĖ░ ņ£äĒĢ┤ ļ░śļīĆņĖĪņ£╝ļĪ£ ļ╣äĒŗĆņ¢┤ ņĀĆņ×æĒĢ£ļŗżļŹśņ¦Ć ĒÄĖņĖĪ ņĀĆņ×æņØä ĒĢ£ Ļ▓░Ļ│╝ņØ╝ Ļ▓āņØ┤ļŗż. ņØ┤ļ¤░ ĒśäņāüņØĆ ņ▓½ ļ▓łņ¦Ė ĒÖśņ×ÉņÖĆ ļ░śļīĆņØś ļ╣äļīĆņ╣ŁņØä Ļ░Ćņ¦ä ĒÖśņ×ÉņØś Ļ▓ĮņÜ░ņŚÉņä£ Ļ┤Ćņ░░ĒĢĀ ņłś ņ׳ņŚłļŖöļŹ░, ņóīņĖĪņ£╝ļĪ£ ĒÄĖņ£äļÉ£ ļ╣äļīĆņ╣ŁņØ┤ ņ׳ņŚłņ£╝ļéś ļ░śļīĆņĖĪņŚÉ Ēä▒Ļ┤ĆņĀłņ”ØņØ┤ ņ׳ņŚłļŹś Ļ▓ĮņÜ░ņØ┤ļŗż(Fig. 11). ĒĢśņĢģĻ│©ņØś ņŚ┤ņä▒ņןĻ│╝ ņĀ£2ĻĖē ļČĆņĀĢĻĄÉĒĢ®ņØś Ļ▓ĮņÜ░ ņĀĢņāüĻĄÉĒĢ®ņŚÉ ļ╣äĒĢ┤ ņāüļīĆņĀüņ£╝ļĪ£ ņ¦¦ņØĆ ĒĢśņĢģņ¦ĆņÖĆ ĒĢśņĢģĻ│╝ļæÉļĪ£ ņØĖĒĢ┤ Ēä▒Ļ┤ĆņĀłņØś ļööņŖżĒü¼ ņĀäņ£äļéś Ļ│©Ļ┤ĆņĀłņŚ╝ņØ┤ ņāØĻĖ░ļŖö ņĘ©ņĢĮĒĢ£ ĒÖśĻ▓ĮņŚÉ ņ׳ļŖö Ļ▓āĻ│╝ ņ£Āņé¼ĒĢśĻ▓ī ļ╣äļīĆņ╣Ł ĒĢśņĢģĻ│©ņŚÉņä£ ĻĄ¼ņĪ░ņĀüņ£╝ļĪ£ ĒĢśņżæņØä ĒĢ┤ņåīĒĢśļŖöļŹ░ ļČłļ”¼ĒĢ£ ĻĄ¼ņĪ░ņØ┤ļŗż[16-19]. ņØ┤ļ¤░ Ļ│©Ļ▓®ņĀü ļ¼ĖņĀ£ļź╝ ĒĢ┤Ļ▓░ĒĢśĻĖ░ ņ£äĒĢ┤ņä£ļŖö Ēä▒ĻĄÉņĀĢņłśņłĀĻ│╝ ņ╣śņĢä ĻĄÉņĀĢņØ┤ ĒĢäņÜöĒĢĀ ņłś ņ׳ļŗż. Ēä▒ĻĄÉņĀĢņłśņłĀņŚÉņä£ Ļ│ĀļĀżĒĢ┤ņĢ╝ĒĢĀ ņĀÉņØĆ ĒŗĆņ¢┤ņ¦ä ĻĄÉĒĢ®ĒÅēļ®┤ņØś ņłśņĀĢ, ĒĢśņĢģņ¦ĆņØś Ļ┤ĆņĀłņŚÉņä£ ļé┤ļĀżņśżļŖö ļ░®Ē¢źĻ│╝ ņĖĪļ░®ņ£╝ļĪ£ ļ▓Śņ¢┤ļéśļĀżļŖö ĒלņØś ņĪ░ņĀł ļō▒ņØ┤ļŗż. ņāüņĢģĻ│©ņØś ņ×¼ņ£äņ╣ś ņŗ£ ņłśņłĀ Ēøä ļ╣äļīĆņ╣ŁņØä ĒĢ┤ņåīĒĢśĻĖ░ ņ£äĒĢ£ ĒĢśņĢģņØś ņ£äņ╣śļź╝ Ļ│ĀļĀżĒĢśņŚ¼ rotation, canting correction, shifting ļō▒ 3ņ░©ņøÉņĀüņ£╝ļĪ£ ņłśņłĀĻ│äĒÜŹņØä ĒĢśņŚ¼ņĢ╝ĒĢ£ļŗż. ĻĘĖļ”¼Ļ│Ā ĒĢśņĢģĻ│©ņØś ņŗ£ņāüļČäĒĢĀņĀłĻ│©ņłĀ Ēøä Ļ│ĀņĀĢ ņŗ£, ĒĢśņĢģĻ│╝ļæÉļź╝ ĒżĒĢ©ĒĢ£ ĻĘ╝ņŗ¼ Ļ│©ĒÄĖņØ┤ Ļ┤ĆņĀłļé┤ņŚÉņä£ ņĢ×ļÆż, ņóīņÜ░ ļō▒ņ£╝ļĪ£ ņ╣śņÜ░ņ╣śļŖö Ēלņ£╝ļĪ£ļČĆĒä░ ņ×Éņ£ĀļĪŁĻ▓ī ĒĢ┤ņĢ╝ ĒĢśļŖöļŹ░(freeing) ņØ┤ ļĢīļŖö ĻĘ╝ņŗ¼Ļ│©ĒÄĖĻ│╝ ņøÉņŗ¼Ļ│©ĒÄĖ ņé¼ņØ┤ņŚÉ ņĀĆĒĢŁņØ┤ ņŚåļÅäļĪØ Ļ│ĀņĀĢņŗ£ņ╝£ņĢ╝ ĒĢ£ļŗż. ņāüņĢģĻ│©Ļ│╝ ĒĢśņĢģĻ│©ņØ┤ ņĀĢņżæņäĀņŚÉ ņ×¼ņ£äņ╣śļÉśņ¢┤ļÅä ĒĢśņĢģĻ│©ņ▓┤ņØś ļČĆĒö╝ ņ░©ņØ┤ņÖĆ Ēä▒ļüØ ļČĆņ£äņØś ļ¬©ņ¢æ ņ░©ņØ┤ļĪ£ ņØĖĒĢ£ ņĢłļ®┤ļ╣äļīĆņ╣ŁņØĆ ĒĢśņĢģĻ│©ņØś Ļ│©ņ▓┤ļ│ĆņŚ░ņä▒ĒśĢņłĀĻ│╝ Ēä▒ļüØ ņłśņłĀņØä ĒåĄĒĢ┤ ņāüļŗ╣ļČĆļČä ĒĢ┤ņåīĒĢ┤ņżä ņłś ņ׳ļŗż. ĒĢśņĢģĻ│©ņØś ņŗ£ņāüļČäĒĢĀņĀłĻ│©ņłĀ ņØ┤Ēøä ĻĘ╝ņŗ¼Ļ│©ĒÄĖņØä Ļ│ĀņĀĢĒĢĀ ļĢī Ļ┤ĆņĀłļČĆņØś ņ£äņ╣śļź╝ ņלļ¬╗ ņäżņĀĢĒĢśļ®┤ ļæÉ ļ▓łņ¦Ė ĒÖśņ×ÉņØś Ļ▓ĮņÜ░ņ▓śļ¤╝ ņłśņłĀ ņØ┤ĒøäņŚÉ Ļ░£ĻĄ¼ņĀ£ĒĢ£ņØ┤ ņ׳Ļ│Ā ĒĢ┤ļŗ╣ļČĆņ£äņØś Ēä▒Ļ┤ĆņĀłņŚÉ ĒåĄņ”ØņØ┤ ņ׳ņØä ņłś ņ׳ļŗż. ĒĢ┤ļŗ╣ ĒÖśņ×ÉļŖö ņóīņĖĪ ĒĢśņĢģĻ│╝ļæÉĻ░Ć glenoid fossaņŚÉņä£ ņĀäļ░®ņ£╝ļĪ£ ļ¢©ņ¢┤ņĀĖ ņ£äņ╣śļÉśņŚłļŖöļŹ░ ņØ┤Ļ▓āņØĆ ĻĘ╝ņŗ¼Ļ│©ĒÄĖņØś Ļ│ĀņĀĢņŗ£ Ēøäļ░®ņ£╝ļĪ£ ļ░ĆļĀż Ļ│ĀņĀĢļÉ£ Ļ▓░Ļ│╝ ņØ╝ ņłś ņ׳ļŗż. Ēøäļ░®ņĢĢļĀźņŚÉ ņØśĒĢ┤ ņøÉņŗ¼ Ļ│©ĒÄĖņØĆ ņóīņĖĪņ£╝ļĪ£ ĒŗĆņ¢┤ņ¦Ćļ®░ ņ╣śņĢäļŖö ĒÄĖņĖĪņ£╝ļĪ£ ļ╣äĒŗĆņ¢┤ņĀĖ ņĀäņ╣śļČĆ Ļ░£ļ░®ĻĄÉĒĢ®Ļ│╝ ĻĄ¼ņ╣śļČĆņØś ļ░śļīĆĻĄÉĒĢ®ņØ┤ ļéśĒāĆļé¼ņ£╝ļ”¼ļØ╝ ņČöņĖĪļÉ£ļŗż. ņØ┤ļ¤¼ĒĢ£ ņØ┤ņ£ĀļĪ£ Ļ┤ĆņĀłņØś ņøÉĒīÉņØĆ ņĀäļ░®ļ│Ćņ£äļÉśĻ│Ā Ēøäļ░®ņĪ░ņ¦üņØś ņĢĢļĀźņ£╝ļĪ£ ĒåĄņ”ØņØä ļŖÉļü╝Ļ▓ī ļÉśļŖöļŹ░, ĻĄÉĒĢ®ļĀźņØ┤ Ļ░ĆĒĢ┤ņ¦Ćļ®┤ Ļ│╝ļÅäĒĢ£ ĒלņØ┤ ņĢäļŗłļŹöļØ╝ļÅä ĻĄ¼ņĪ░ņĀüņ£╝ļĪ£ ĒåĄņ”ØĻ│╝ Ēä▒Ļ┤ĆņĀłņ”ØņØä ņØ╝ņ£╝Ēé¼ ņłś ņ׳ņØä Ļ▓āņØ┤ļŗż. ļśÉĒĢ£ ņלļ¬╗ Ļ│ĀņĀĢļÉ£ ĒĢśņĢģņ¦ĆņØś Ļ▓ĮņÜ░, Ļ┤ĆņĀłņŚÉ ņĀäĒĢ┤ņ¦ĆļŖö ĒלņØś ļ░®Ē¢źņØ┤ ņóīņÜ░ ļŗżļź╝ ņłś ņ׳ļŗż. ņ▓½ ļ▓łņ¦Ė ņé¼ļĪĆņÖĆ Ļ░ÖņØ┤ ĒĢśņĢģņ¦ĆņØś ĻĖĖņØ┤Ļ░Ć ņ¢æņ¬ĮņØ┤ ļŗżļźĖ Ļ▓ĮņÜ░, Ļ┤ĆņĀłņŚÉ ņĀäļŗ¼ļÉśļŖö ĒלņØ┤ ņ¦¦ņØĆ ņĖĪņØä ņČĢņ£╝ļĪ£ ĒĢśņżæņØś ņ░©ņØ┤Ļ░Ć ņ׳ņ¢┤ ņØ┤ĒÖśļÉ£ ņ¬ĮņŚÉ Ēä▒Ļ┤ĆņĀł ņ¦łĒÖśņØ┤ ļ░£ņāØĒĢĀ ņłś ņ׳ļŖö Ļ▓āņØä ņé┤ĒÄ┤ļ│┤ņĢśļŗż. ņØ┤ņÖĆ ļ╣äņŖĘĒĢśĻ▓ī Ļ┤ĆņĀłļĪ£ļČĆĒä░ ĒĢśņĢģĻ░üņ£╝ļĪ£ņØś ļ░®Ē¢źņØ┤ ņä£ļĪ£ ļŗżļźĖ Ļ▓ĮņÜ░, ĒĢśņżæ ņĀäļŗ¼ļ¤ēņØś ņ░©ņØ┤ļĪ£ Ēä▒Ļ┤ĆņĀłņ¦łĒÖśņØ┤ ņāØĻĖĖ ņłś ņ׳ļŗż. ļö░ļØ╝ņä£ ļæÉ ļ▓łņ¦Ė ņé¼ļĪĆņŚÉņä£ņ▓śļ¤╝ ĒĢśņĢģņ¦ĆņØś Ļ│ĀņĀĢ ņŗ£ ņ¢æņĖĪņØś Ļ░üļÅäļź╝ ļ╣äņŖĘĒĢśĻ▓ī ņäżņĀĢĒĢ┤ņŻ╝ļŖö Ļ▓āņØ┤ ņØ┤Ēøä Ēä▒Ļ┤ĆņĀłņŚÉ ņ¢æĒśĖĒĢ£ ĒĢśņżæ ņĀäļŗ¼ ĻĄ¼ņĪ░ņŚÉ ņ£Āļ”¼ĒĢśļŗż(Fig. 7). ņłśņłĀ ņØ┤Ēøä Ļ░£ĻĄ¼ņŚ░ņŖĄņØä ĒåĄĒĢśņŚ¼ ņĀĢņāü ļ▓öņ£äņØś Ļ░£ĻĄ¼ļ¤ēņØä ĒÜīļ│ĄĒĢ©ņŚÉ ņ׳ņ¢┤ ļæÉ ļ▓łņ¦Ė ņé¼ļĪĆņŚÉņä£ļŖö Ļ│ĀļĀżĒĢ┤ņĢ╝ĒĢĀ ņĀÉļōżņØ┤ ņ׳ņŚłļŗż. ņØ┤ņĀäņØś 3ļ▓łņŚÉ Ļ▒Ėņ╣£ Ēä▒ĻĄÉņĀĢņłśņłĀļĪ£ ņØĖĒĢ┤ ņ×öņĪ┤ĒĢśļŖö ĻĘ╝ņŗ¼Ļ│©ĒÄĖņØś ņ¢æņØ┤ ņĀüņŚłĻ│Ā ņØ┤ļĪ£ ņØĖĒĢ┤ Ļ░£ĻĄ¼ņŚ░ņŖĄ ņŗ£ Ļ│╝ļÅäĒĢ£ ĒלņŚÉ ņØśĒĢ£ ļÆżĒŗĆļ”╝ņØä ņĪ░ņŗ¼ĒĢ┤ņĢ╝ Ē¢łļŗż. ĻĘĖļ”¼Ļ│Ā Ļ│©ļ¦ēĻ│╝ ņĀĆņ×æĻĘ╝ ņŻ╝ņ£äņØś ļ░śĒØöņĪ░ņ¦üņä▒ Ļ▓ĮĻ▓░Ļ░Éņ£╝ļĪ£ ņś©ņŚ┤ņØä ļÅÖļ░śĒĢ£ ļ¼╝ļ”¼ņ╣śļŻīļź╝ ĒåĄĒĢ┤ ņĀĆņ×æĻĘ╝ņØś ĒÖ£ņä▒ĒÖö ļ▓öņ£äļź╝ ņĀÉņ░© ļäōĒśĆĻ░öļŗż. ņłśņłĀ ņĀä ņāüņĢģĻ│©ņØś ņÜ░ņĖĪ ĒÄĖņ£äļĪ£ ņØĖĒĢ┤ ļŹöņÜ▒ ņóīņĖĪņ£╝ļĪ£ ĒŗĆņ¢┤ņĀĖ ļ│┤ņØ┤ļŹś ĒĢśņĢģņØä ļ│┤ņāüņä▒ Ļ░£ĻĄ¼ĒÖ£ļÅÖņ£╝ļĪ£ ņżæņŗ¼ņäĀņØä ļ¦×ņČöļĀżĻ│Ā Ē¢łļŹś ņŖĄĻ┤ĆņØä ĻĄÉņĀĢĒĢśĻĖ░ ņ£äĒĢ£ Ē¢ēļÅÖņÜöļ▓ĢļÅä ņŗ£Ē¢ēĒĢśņśĆļŗż. Ē¢ēļÅÖņÜöļ▓ĢņØĆ ņŖĄĻ┤ĆņØś ĻĄÉņĀĢņ£╝ļĪ£ ņ¦łļ│æņØä ņ╣śļŻīĒĢśļŖö ļ░®ļ▓ĢņØ┤ļ®░ ņØ┤ņżæ ļ░öņØ┤ņśżĒö╝ļō£ļ░▒ņØĆ ņ×Éļ░£ņĀüņ£╝ļĪ£ ņĀ£ņ¢┤ĒĢĀ ņłś ņŚåļŖö ņāØļ”¼ ĒÖ£ļÅÖņØä Ļ│ĄĒĢÖņĀüņ£╝ļĪ£ ņĖĪņĀĢĒĢśņŚ¼ ņ¦ĆĻ░ü Ļ░ĆļŖźĒĢ£ ņĀĢļ│┤ļĪ£ ņāØņ▓┤ņŚÉ ņĀäļŗ¼ĒĢśĻ│Ā, ĻĘĖĻ▓āņØä ļ░öĒāĢņ£╝ļĪ£ ĒĢÖņŖĄ, ĒøłļĀ©ņØä ļÉśĒÆĆņØ┤ĒĢśņŚ¼ ņ×ÉĻĖ░ ņĀ£ņ¢┤ļź╝ ļŗ¼ņä▒ĒĢśļŖö ĻĖ░ļ▓ĢņØ┤ļØ╝ ņĢīļĀżņĀĖ ņ׳ļŗż[21]. Ēä▒Ļ┤ĆņĀł ņ¦łĒÖśņØś ļČäņĢ╝ņŚÉņä£ ļ░öņØ┤ņśżĒö╝ļō£ļ░▒ņØĆ ņłśļ®┤ ņØ┤Ļ░łņØ┤ļź╝ ņĪ░ņĀłĒĢśļŖöļŹ░ ņóŗņØĆ ņŚŁĒĢĀņØä ĒĢ£ļŗżĻ│Ā ļ│┤Ļ│ĀļÉśņ¢┤ņ¦äļŗż[22,23]. ņäĖ ļ▓łņ¦Ė ĒÖśņ×ÉņØś Ļ▓ĮņÜ░, Ēä▒Ļ┤ĆņĀł ļČĆņ£äņØś ĒåĄņ”ØĻ│╝ ņŗ¼ĒĢ£ ņØ┤Ļ░łņØ┤ļĪ£ ņØĖĒĢ┤ ņ╣śĻ│╝ņØśņøÉņŚÉņä£ ņŖżĒöīļ”░ĒŖĖ ņ╣śļŻī, ļ│┤ĒåĪņŖż ņ╣śļŻī, ļ¼╝ļ”¼ņ╣śļŻī ļō▒ ņłśļģäĻ░äņØś ņ╣śļŻīļź╝ ļ░øņĢśņ¦Ćļ¦ī ļéśņĢäņ¦Ćņ¦Ć ņĢŖņĢä ļ░öņØ┤ņśżĒö╝ļō£ļ░▒ņØä ĒåĄĒĢ£ ņłśļ®┤ ņØ┤Ļ░łņØ┤ļź╝ Ļ┤Ćļ”¼ĒĢśĻ│Āņ×É ĒĢśņśĆļŗż. ĒåĄņ”ØņØĆ ņŻ╝ļĪ£ ņĖĪļæÉļČĆņŚÉņä£ ņ׳ņŚłņ£╝ļ®░, ņłśļ®┤ ņżæ ļ░£ņāØļÉ£ ņĀĆņ×æĻĘ╝ņØś Ļ│╝ĻĖ┤ņןņ£╝ļĪ£ ņĢäņ╣©ņŚÉ ĻĖ░ņāü Ēøä ļæÉĒåĄņØ┤ ņŗ¼ĒĢśņśĆļŗż. Ļ│╝ĻĖ┤ņןļÉśļŖö ĻĘ╝ņ£ĪņØś ĒÖ£ļÅÖņØä ņżäņØ┤ĻĖ░ ņ£äĒĢ┤ ļ│┤ĒåĪņŖż ņŻ╝ņé¼Ļ░Ć ņŻ╝ļĪ£ ņé¼ņÜ®ļÉśļŖöļŹ░ ĻĄÉĻĘ╝ņŚÉļ¦ī ņŻ╝ņé¼ĒĢśļŖö Ļ▓ĮņÜ░, ņĖĪļæÉĻĘ╝ņØś ĒÖ£ļÅÖņØ┤ Ļ░ĢĒĢ┤ņĀĖņä£ ņśżĒ׳ļĀż ņĖĪļæÉļČĆņŚÉ ĒåĄņ”ØņØä ĒśĖņåīĒĢśĻĖ░ ĒĢ£ļŗż. ņØ┤ ĒÖśņ×ÉņØś Ļ▓ĮņÜ░ņŚÉļÅä ņØ┤ņĀä ņŻ╝ņé¼ ļČĆņ£äĻ░Ć ņĢäļלņ¬ĮņŚÉ ĻĄŁĒĢ£ļÉśņ¢┤ ņ׳ņŚłļŗżļŖö ņĀÉņØĆ ĻĄÉĻĘ╝ņØś ņ£äņČĢņØ┤ ņśżĒ׳ļĀż ņĖĪļæÉĻĘ╝ņØś ĻĘ╝ņ£ĪĒåĄņØä ļ░£ņāØņŗ£Ēéżņ¦Ć ņĢŖņĢśļéśĒĢśļŖö ņČöņĖĪņØä ĒĢ┤ļ│╝ ņłś ņ׳ļŗż. ļ│┤ĒåĪņŖż ņŻ╝ņé¼ļŖö 3Ļ░£ņøö Ļ░äņØś ĒÜ©Ļ│╝ļź╝ Ļ░Ćņ¦ĆĻ│Ā ņ׳ņ¢┤ņä£ ĻĘĖ ņØ┤ĒøäņŚÉ Ļ┤Ćļ”¼Ļ░Ć ļÉśņ¦Ć ņĢŖņ£╝ļ®┤ ļŗżņŗ£ ņĀĆņ×æĻĘ╝ņØś Ļ│╝ĻĖ┤ņןņŚÉ ņØśĒĢ£ Ēä▒Ļ┤ĆņĀł ņ¦łĒÖśņØä ņ×¼ļ░£ņŗ£Ēé¼ ņłś ņ׳ļŗż. ņŖżĒöīļ”░ĒŖĖļŖö ņĀ£ņ×æ Ēøä ņé¼ņÜ®ĒĢśļŗżĻ░Ć ņłśļ®┤ņŚÉ ļ░®ĒĢ┤Ļ░Ć ļÉśĻ│Ā ļČłĒÄĖĒĢśļŗżļŖö ņØ┤ņ£ĀļĪ£ ņĀüĻĘ╣ņĀüņØĖ ņé¼ņÜ®ņØ┤ ĒלļōżņŚłļŗżĻ│Ā ĒĢśņśĆņ£╝ļ®░, ņŗżņĀ£ļĪ£ ņŖżĒöīļ”░ĒŖĖ ņ×Éņ▓┤Ļ░Ć ņłśļ®┤ ņØ┤Ļ░łņØ┤ļź╝ ļ░®ņ¦ĆĒĢśĻĖ░ ļ│┤ļŗżļŖö ņ╣śņĢäļź╝ ļ│┤ĒśĖĒĢśĻ│Ā Ēä▒Ļ┤ĆņĀł ļČĆņ£äņŚÉ Ļ░äĻ▓®ņŚÉ ņØśĒĢ£ ņĢłņĀĢņØä ņŻ╝ĻĖ░ņŚÉ ļ╣äĻĖ░ļŖźņĀü ņĀĆņ×æĒÖ£ļÅÖņØä ņ░©ļŗ©ĒĢśļŖöļŹ░ļŖö ĒĢ£Ļ│äĻ░Ć ņ׳ļŗż. ņé¼ņÜ®ļÉ£ ļ░öņØ┤ņśżĒö╝ļō£ļ░▒ ņןņ╣śļŖö ņłśļ®┤ ņżæ ņĖĪļæÉĻĘ╝ņØś ĒÖ£ļÅÖņØä ĻĘ╝ņĀäļÅäļź╝ ņØ┤ņÜ®ĒĢśņŚ¼ ņŗżņŗ£Ļ░äņ£╝ļĪ£ ņĖĪņĀĢĒĢśĻ│Ā, ņØ╝ņĀĢ ņŚŁņ╣ś ņØ┤ņāüņØś Ļ│╝ĻĖ┤ņןņØ┤ Ļ░Éņ¦ĆļÉśļ®┤ ņāØņ▓┤ņŚÉ ņ¦äļÅÖ ņ×ÉĻĘ╣ņØä ņŻ╝ņ¢┤ clenchingņØ┤ļéś grindingņØä ņ¢ĄņĀ£ĒĢśļÅäļĪØ ņäżĻ│äļÉśņ¢┤ ņ׳ļŗż. ļ│Ė ņŚ░ĻĄ¼ņŚÉņä£ļŖö ņØ┤ļ¤¼ĒĢ£ ĻĖ░ļŖźņØä Ļ░¢ņČś ņāüņÜ®ĒÖöļÉ£ ņןņ╣śņØĖ Goodeeps(Miraclare, Republic of Korea) [24]ļź╝ ņé¼ņÜ®ĒĢśņśĆļŗż. ņé¼ņÜ® ņŗ£ņ×æ Ēøä 3ņØ╝Ļ╣īņ¦Ć ņןņ╣śļź╝ ĒåĄĒĢ┤ ņØ┤Ļ░łņØ┤Ļ░Ć ņ׳ņØä ļĢī ĻĘ╝ņĀäļÅäņŚÉņä£ ĒÖĢņØĖņØ┤ ļÉśņŚłņ£╝ļéś ļČĆņ░® ļČĆņ£äņØś ņØ┤ļ¼╝Ļ░ÉĻ│╝ ņ¦äļÅÖņØś ņäĖĻĖ░ ņĪ░ņĀĢ ļŗ©Ļ│äņØś ļČłĒÄĖĻ░É ļō▒ņ£╝ļĪ£ ņłśļ®┤ ņżæ ņ×ĀņØä Ļ╣©ļŖö Ļ▓ĮņÜ░Ļ░Ć ņ׳ņŚłļŗż. ņØ┤ ĻĖ░Ļ░ä ļÅÖņĢł ņ£ĀņØśļ»ĖĒĢ£ ņØ┤Ļ░łņØ┤(4ņ┤ł ņØ┤ņāü)ļŖö 4ņŚÉņä£ 13ĒÜī ņĀĢļÅä ņ׳ņŚłĻ│Ā, ļŗżņØīļéĀ ņĢäņ╣©ņŚÉ ņØ╝ņ¢┤ļé¼ņØä ļĢī ļČłĒÄĖĻ░ÉņØ┤ ņĀÉņĀÉ Ļ░ÉņåīĒĢśļŖö ĻĖ░ļČäņØ┤ ļōżņŚłļŗżĻ│Ā ĒĢ£ļŗż. 5ņØ╝ņ░© ļČĆĒä░ļŖö ņןņ╣śļź╝ ņé¼ņÜ®ĒĢśļŖöļŹ░ Ēü¼Ļ▓ī ļČłĒÄĖĒĢ£ ņĀÉņØ┤ ņŚåņŚłĻ│Ā ņé¼ņÜ® Ēøä 3ņŻ╝ņ░©ņŚÉņä£ļČĆĒä░ ņ¦äļÅÖņØ┤ ĒĢäņÜöĒĢĀ ņĀĢļÅäņØś ņØ┤Ļ░łņØ┤ļŖö ļ░£ņāØĒĢśņ¦Ć ņĢŖņĢśļŗż. ņ¦äļÅÖņØä ņŻ╝ņ¢┤ļÅä ņØ┤Ļ░łņØ┤Ļ░Ć Ļ│äņåŹļÉśļ®┤ ņŻ╝ņ¢┤ņ¦ĆļŖö ņ¦äļÅÖņØś Ēü¼ĻĖ░ļź╝ ļåÆņŚ¼ ņØ┤Ļ░łņØ┤Ļ░Ć ļ®łņČ£ ļĢīĻ╣īņ¦Ć ņ¦äĒ¢ēļÉśĻĖ░ļÅä ĒĢśņśĆļŗż(Fig. 12). ļ╣äĻĖ░ļŖźņĀü Ē¢ēļÅÖņØä ĒĢĀ ļĢī ņāØņ▓┤ļé┤ļĪ£ ņŗĀĒśĖļź╝ ņŻ╝ņ¢┤ ņĀ£ņ¢┤ĒĢśļŖö ļ░®ņŗØņØś ļ░öņØ┤ņśżĒö╝ļō£ļ░▒ņØĆ ņłśļ®┤ ņØ┤Ļ░łņØ┤ņØś ļ░£ņāØņŗ£ ņ¦äļÅÖņØä ņŻ╝ņ¢┤ ĻĘ╝ ĒÖ£ļÅÖņØä ļ®łņČöĻ▓ī ĒĢśĻ│Ā ņØ┤Ļ▓āņØ┤ ļ░śļ│ĄļÉśļ®┤ ļ¼┤ņØśņŗØ ņżæņŚÉ ĒĢÖņŖĄņØ┤ ļÉśņ¢┤ ņØ┤Ēøä ļ╣äĻĖ░ļŖźņĀü ņŖĄĻ┤ĆņØä ĒÜīĒö╝ĒĢśņ¦Ć ņĢŖņØäĻ╣īļØ╝Ļ│Ā ņČöņĖĪĒĢ┤ ļ│╝ ņłś ņ׳ļŗż. ņŗżņĀ£ļĪ£ ĒÖśņ×ÉļŖö 6ņŻ╝ ņØ┤Ēøä ļ░öņØ┤ņśżĒö╝ļō£ļ░▒ ņןņ╣śļź╝ ņé¼ņÜ®ĒĢśņ¦Ć ņĢŖņØĆ ņāüĒā£ņŚÉņä£ļÅä ņĀĆņ×æĻĘ╝ņŚÉ ĒלņØä ņŻ╝ļŖö Ļ▓āņŚÉ ļīĆĒĢ£ ņØĖņ¦ĆņÖĆ Ļ▓ĮĻ│äļź╝ ĒĢśņŚ¼ ņØ┤ņĀäņØś Ēä▒Ļ┤ĆņĀł ņ¦łĒÖśņØ┤ ņżäņŚłļŗżĻ│Ā ĒĢśņśĆņ£╝ļéś, ņØ┤ņŚÉ ļīĆĒĢ£ ĻĘ╝Ļ▒░ņ×ÉļŻīĻ░Ć ļČĆņĪ▒ĒĢśņŚ¼ ņØ┤Ēøä ņŚ░ĻĄ¼Ļ░Ć ĒĢäņÜöĒĢśļŗżĻ│Ā ņāØĻ░üļÉ£ļŗż.
Ēä▒Ļ┤ĆņĀł ņ¦łĒÖśņØ┤ ņ׳ļŖö ĒÖśņ×Éļź╝ ļ¼Ėņ¦äĒĢĀ ļĢī ļŗżņłśņØś Ļ▓ĮņÜ░ņŚÉņä£ ļ│ĖņØĖņØś Ļ│╝ļÅäĒĢ£ ņĀĆņ×æļĀźņØä ņØĖņ¦ĆĒĢśņ¦Ć ļ¬╗ĒĢ£ļŗż. ĻĘĖļōżņØĆ ņłśļ®┤ ņżæ ņØ┤ļź╝ Ļ░ĆļŖö Ļ▓āņØ┤ ņŚåļŗżĻ│Ā ĒĢśĻ│Ā ĒÅēņåīņŚÉ ņ¦ĆĻĘĖņŗ£ Ļ╣©ļ¼╝Ļ│Ā ņ׳ļŖö ņŖĄĻ┤ĆņØ┤ ņ׳ļŖöņ¦Ć ņĢīņ¦Ć ļ¬╗ĒĢ£ļŗż. ļśÉĒĢ£ Ēä▒Ļ┤ĆņĀł ņ¦łĒÖśņØ┤ ņ׳ļŖö ņāüĒā£ņŚÉņä£ļŖö ļö▒ļö▒ĒĢśĻ▒░ļéś ņ¦łĻĖ┤ ņØīņŗØņØä ņĀ£ļīĆļĪ£ ņö╣ņ¦Ć ļ¬╗ĒĢśņŚ¼ Ēä▒ņŚÉ ĒלņØä ņŻ╝ņ¦Ć ņĢŖļŖöļŹ░ļÅä Ļ│äņåŹ ņĢäĒöäļŗżĻ│Ā ĒĢśļŖö Ļ▓ĮņÜ░ļÅä ņ׳ļŗż. ņØ┤Ļ▓āņØĆ ĒÖśņ×ÉĻ░Ć ņłśļ®┤ ņżæņŚÉ clenchingĻ│╝ grindingņØä ĒĢśĻ▒░ļéś ņØ┤Ļ▓āņØś ņŚ░ņןņ£╝ļĪ£ ļé«ņŚÉļÅä ļ¼┤ņØśņŗØņĀüņ£╝ļĪ£ Ļ╣©ļ¼╝Ļ│Ā ņ׳ņØä Ļ░ĆļŖźņä▒ņØ┤ ļåÆļŗż. ņØ┤ļ¤¼ĒĢ£ Ļ▓ĮņÜ░, ļ░öņØ┤ņśżĒö╝ļō£ļ░▒ ņןņ╣śļŖö ĒÖśņ×ÉņÖĆ ņØśņé¼ņŚÉĻ▓ī ĻĘ╝ņĀäļÅä ļŹ░ņØ┤Ēä░ļź╝ ņØ┤ņÜ®ĒĢ£ ņĀĢĒÖĢĒĢ£ ņĀĆņ×æĻĘ╝ņØś ĒÖ£ļÅÖņØä ņĀ£Ļ│ĄĒĢśņŚ¼ Ēä▒Ļ┤ĆņĀł ņ╣śļŻīņØś ņ¦äļŗ©ņŚÉ ļÅäņøĆņØä ņżä ņłś ņ׳Ļ│Ā, ņØśļŻīĻĖ░Ļ┤ĆņŚÉņä£ļ┐Éļ¦ī ņĢäļŗłļØ╝ ņŗżņāØĒÖ£ ĒÖśĻ▓ĮņŚÉņä£ ļ╣äĻĖ░ļŖźņĀüņØĖ ņĀĆņ×æļĀźņØä ņĖĪņĀĢĒĢĀ ņłś ņ׳Ļ│Ā ņ£ĀĒĢ┤ĒĢ£ Ē¢ēļÅÖņŚÉ ļīĆĒĢ┤ņä£ ņĪ░ņĀłĒĢĀ ņłś ņ׳ĻĖ░ņŚÉ Ēä▒Ļ┤ĆņĀł ņ¦łĒÖśņØś Ē¢ēļÅÖņ╣śļŻīņŚÉ ņ׳ņ¢┤ņä£ Ēü░ ņŚŁĒĢĀņØä ĒĢĀ ņłś ņ׳ļŗżĻ│Ā ļ│Ėļŗż. Ēä▒Ļ┤ĆņĀł ļČĆņ£äņŚÉ Ļ│äņåŹļÉśļŖö ļČĆĒĢśļŖö ņĀĆņ×æĻĘ╝ņØś ĒåĄņ”ØĻ│╝ Ļ┤ĆņĀłņØś ļé┤ņןņ”Ø, ĻĘĖļ”¼Ļ│Ā Ļ│©Ļ┤ĆņĀłņŚ╝ ļō▒ņØä ņ£Āļ░£ĒĢśĻ│Ā ņ╣śļŻī ņØ┤ĒøäņŚÉļÅä ņ×¼ļ░£ĒĢśĻ▓ī ĒĢśļŖö ņŻ╝ņÜö ņÜöņØĖņ£╝ļĪ£ ņ×æņÜ®ĒĢśĻĖ░ ļĢīļ¼ĖņŚÉ ĒלņØś ļ╣äļīĆņ╣Łņä▒Ļ│╝ ļ╣äņĀĢņāüņĀü Ļ░ĢļÅä ļ░Å ļ╣łļÅäļź╝ ņĪ░ņĀłĒĢśļŖö Ļ▓āņØ┤ Ēä▒Ļ┤ĆņĀł ņ¦łĒÖś ņ╣śļŻīņØś ņŗ£ņ×æņØ┤ļØ╝Ļ│Ā ļ│╝ ņłś ņ׳ļŗż. ĒŖ╣Ē׳ Ē¢ēļÅÖņÜöļ▓Ģ ņżæ ĒĢśļéśņØĖ ļ░öņØ┤ņśżĒö╝ļō£ļ░▒ ņןņ╣śļŖö ņŖĄĻ┤Ćņä▒ ņ¦łĒÖśņØĖ Ēä▒Ļ┤ĆņĀł ņ¦łĒÖśņØś ņ¦äļŗ© ļ░Å Ļ┤Ćļ”¼ņŚÉ ļÅäņøĆņØä ņżä ņłś ņ׳ļŗż.
Figure┬Ā1.
A. 3D facial CT (frontal view). B. 3D facial CT (submentovertex view). C. Panoramic radiograph.

REFERENCES
1. Dworkin SF, LeResche, L.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Review, criteria, examinations and specifications, critique. J Craniomandib Disord 1992; 6: 301ŌĆō55.

2. Pullinger AG, Seligman DA, Gornbein JA.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risk and relative odd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s a function of common occlusal features. J Dent Res 1993; 72: 968ŌĆō79.



3. Hylander L. Functional anatomy and biomechanics of the masticatory apparatus. In: Laskin, DM, Greene CS, Hylander WL.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 evidence-based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Chicago; Quintessence Pub: 2006. p. 3-34.
4. Krohn S, Brockmeyer P, Kubein-Meesenburg D, Kirschneck C, Buergers R. Elongated styloid process in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 is there a link? Ann Anat 2018; 217: 118ŌĆō24.


5. Smith SB, Maixner DW, Greenspan JD, Dubner R, Fillingim RB, Ohrbach R et al. Potential genetic risk factors for chronic TMD: genetic associations from the OPPERA case control study. J Pain 2011; 12: (11 Suppl):T92ŌĆō101.



6. Breul R. Biomechanical analysis of stress distribution in the temporomandibular joint. Ann Anat 2007; 189: 329ŌĆō35.


7. Breul R, Mall G, Landgraf J, Scheck R. Biomechanical analysis of stress distribution in the human temporomandibular-joint. Ann Anat 1999; 181: 55ŌĆō60.


8. del Palomar AP, Santana-Pen├Łn U, Mora-Berm├║dez MJ, Doblar├® M. Clenching TMJs-loads increases in partial edentates: a 3D finite element study. Ann Biomed Eng 2008; 36: 1014ŌĆō23.



9. Santana-Mora U, Mart├Łnez-├Źnsua A, Santana-Pen├Łn U, del Palomar AP, Banzo JC, Mora MJ. Muscular activity during isometric incisal biting. J Biomech 2014; 47: 3891ŌĆō7.


10. Tanaka E, Detamore MS, Mercuri LG. Degenerative disorders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eti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J Dent Res 2008; 87: 296ŌĆō307.



11. Inui M, Fushima K, Sato S. Facial asymmetry in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J Oral Rehabil 1999; 26: 402ŌĆō6.


12. Santana-Mora U, L├│pez-Cedr├║n J, Su├Īrez-Quintanilla J, Varela-Centelles P, Mora MJ, Da Silva JL et al. Asymmetry of dental or joint anatomy or impaired chewing function contribute to chronic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Ann Anat 2021; 238: 151793.


13. Suvinen TI, Reade PC, Kemppainen P, K├Čn├Čnen M, Dworkin SF. Review of aetiological concepts of temporomandibular pain disorders: towards a biopsychosocial model for integration of physical disorder factors with psychological and psychosocial illness impact factors. Eur J Pain 2005; 9: 613ŌĆō33.


14. Schiffman E, Ohrbach R, Truelove E, Look J, Anderson G, Goulet JP et al.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DC/TMD) for clinical and Research Applications: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RDC/TMD consortium network* and orofacial pain special interest group. J Oral Facial Pain Headache 2014; 28: 6ŌĆō27.


15. Lobbezoo F, Ahlberg J, Raphael KG, Wetselaar P, Glaros AG, Kato T et al.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assessment of bruxism: report of a work in progress. J Oral Rehabil 2018; 45: 837ŌĆō44.




16. Nickerson JW, Moystad A. Observations on individuals with radiographic bilateral condylar remodeling. J Craniomandibular Pract 1982; 1: 20ŌĆō37.


17. Katzberg RW, Tallents RH, Hayakawa K, Miller TL, Goske MJ, Wood BP. Internal derangements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findings in the pediatric age group. Radiology 1985; 154: 125ŌĆō7.


18. Fushima K, Akimoto S, Takamoto K, Sato S, Suzuki Y. Morphological feature and incidence of TMJ disorders in mandibular lateral displacement cases. Nihon Kyosei Shika Gakkai Zasshi 1989; 48: 322ŌĆō8.

19. Manfredini D, Seg├╣ M, Arveda N, Lombardo L, Siciliani G, Rossi A et al.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in patients with different facial morphology. 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J Oral Maxillofac Surg 2016; 74: 29ŌĆō46.

20. Ananthan S, Pertes RA, Bender SD. Biomechanics and derangements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 Dent Clin North Am 2023; 67: 243ŌĆō57.


21. Voerman GE, Vollenbroek-Hutten MM, Hermens HJ. Changes in pain, disability, and muscle activation patterns in chronic whiplash patients after ambulance myofeedback training. Clin J Pain 2006; 22: 656ŌĆō63.

22. Tate JJ, Milner CE. Real-time kinematic, temporospatial, and kinetic biofeedback during gait retraining in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Phys Ther 2010; 90: 1123ŌĆō34.



23. Florjanski W, Malysa A, Orzeszek S, Smardz J, Olchowy A, Paradowska-Stolarz A et al. Evaluation of biofeedback usefulness in masticatory muscle activity management - a systematic review. J Clin 2019; 30: 766ŌĆō34.

24. Goodeeps, Miraclare Co., Ltd., Republic of Korea. Available at: https://miraclare.com/#what_we_make_1.
- TOOLS
-
METRICS

-
- 0 Crossref
- 0 Scopus
- 411 View
- 14 Download
- ORCID iDs
-
Jinhyuk Hwang

https://orcid.org/0009-0006-4677-5663 - Related articles
-
Degenerative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treated with prolotherapy: Case series2025 April;63(4)
Occlusal appliance therapy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2021 October;59(10)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temporomandibular disorders2020 June;58(6)
Injection therapy for management of temporomandibullar joint disorders2019 April;57(4)
Treatment of hearing loss due to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Case Report2019 April;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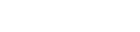











 PDF Links
PDF Links PubReader
PubReader Full text via DOI
Full text via DOI Download Citation
Download Citation Print
Pr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