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Dent Assoc > Volume 63(1); 2025 > Article |
|
Abstract
Table 1.
Table 2.
Table 3.
Table 4.
Table 5.
Table 6.
Table 7.
Table 8.
REFERENCES
-
METRICS

-
- 0 Crossref
- 0 Scopus
- 516 View
- 25 Download
- ORCID iDs
-
Jeong-Hyun Kang

https://orcid.org/0000-0001-7124-8693Hong-Seop Kho

https://orcid.org/0000-0001-9960-9892Jong Seob So

https://orcid.org/0000-0002-1569-4039Hoi-In Jung

https://orcid.org/0000-0002-1978-6926Nam-Hee Kim

https://orcid.org/0000-0001-5463-0073Jina Lee Linton

https://orcid.org/0000-0003-3935-3367Jihoon Kim

https://orcid.org/0000-0003-0861-7833Se Myung Kim

https://orcid.org/0009-0002-0614-3144Seongho Choi

https://orcid.org/0009-0005-9554-707X - Related art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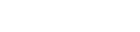
 PDF Links
PDF Links PubReader
PubReader ePub Link
ePub Link Full text via DOI
Full text via DOI Download Citation
Download Citation Print
Pr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