ŌģĀ. ņä£ļĪĀ
ĒśäļīĆ ņé¼ĒÜīņØś Ļ│ĀļĀ╣ĒÖöĻ░Ć ļŹöņÜ▒ Ļ░ĆņåŹĒÖöļÉ©ņŚÉ ļö░ļØ╝ Ļ│ĀļĀ╣ĒÖöļÉ£ ļģĖņØĖņØĖĻĄ¼ļź╝ ņ£äĒĢ£ ņÜöņ¢æ ļ░Å ļ│Ąņ¦Ćņŗ£ņäżņØś ĒĢäņÜöņä▒ņØĆ ņĀÉņ░© ņ”ØĻ░ĆĒĢśļŖö ņČöņäĖņØ┤ļŗż. ņØ┤ļ¤¼ĒĢ£ ņāüĒÖ®ņŚÉ ļ░£ļ¦×ņČöņ¢┤ ņØ┤ļ»Ė ņ╣śĻ│╝ņØśņé¼Ļ░Ć ņÜöņ¢æņŗ£ņäżņŚÉņä£ ņżæņÜöĒĢ£ ņŚŁĒĢĀņØä ņłśĒ¢ēĒĢśņĢ╝ ĒĢ£ļŗżļŖö ņĄ£ĻĘ╝ņØś ņŚ░ĻĄ¼ļ│┤Ļ│Ā ņŚŁņŗ£ ņĪ┤ņ×¼ĒĢ£ļŗż[
1]. ļśÉĒĢ£ ņØ┤ļź╝ ļ░śņ”ØĒĢśļō» ļ░®ļ¼ĖņÜöņ¢æņä£ļ╣äņŖż ļō▒ņØś ņ×¼Ļ░ĆļģĖņØĖļ│Ąņ¦Ćņŗ£ņäż ļ░Å ļģĖņØĖņØśļŻīļ│Ąņ¦Ćņŗ£ņäżņØś ņłśļŖö 2018ļģä Ļ░üĻ░ü 3,500Ļ░£ņåī, 5,300Ļ░£ņåīņŚÉ ļ╣äĒĢ┤ 2022ļģä Ļ░üĻ░ü 13,200Ļ░£ņåī, 6,000Ļ░£ņåīļĪ£ Ļ░ĆĒīīļźĖ ĒÅŁņ£╝ļĪ£ ņ”ØĻ░ĆĒĢśņśĆļŗż[
2]. ļśÉĒĢ£ Ļ▒┤Ļ░Ģļ│┤ĒŚśņŚ░ĻĄ¼ņøÉņØś ņןĻĖ░ņÜöņ¢æ ņČöĻ│äņŚÉ ļö░ļź┤ļ®┤ 2023ļģäņØś ņןĻĖ░ņÜöņ¢æ ņłśĻĖēņ×ÉļŖö 110ļ¦īļ¬ģņ£╝ļĪ£ ņČöņé░ļÉśļ®░, ņŗżņĀ£ļĪ£ ņןĻĖ░ņÜöņ¢æņä£ļ╣äņŖżļź╝ ņØ┤ņÜ® ņżæņØĖ ņłśĻĖēņ×ÉļŖö ĻĘĖņżæ ņĢĮ 93ļ¦īļ¬ģņ£╝ļĪ£ ņČöņé░ļÉśņŚłļŗż[
3]. ļģĖņØĖņØĖĻĄ¼ ņ”ØĻ░ĆĒÅŁņØä Ļ│ĀļĀżĒĢśņśĆņØä ļĢī Ē¢źĒøä ņןĻĖ░ņÜöņ¢æņä£ļ╣äņŖż ņØ┤ņÜ®ņ×ÉļŖö 2027ļģä ņĢĮ 120ļ¦īļ¬ģ, 2030ļģä ņĢĮ 135ļ¦īļ¬ģņ£╝ļĪ£ ņ¦ĆņåŹņĀüņ£╝ļĪ£ ņ”ØĻ░ĆĒĢĀ Ļ▓āņ£╝ļĪ£ ņĀäļ¦ØļÉśņŚłļŗż[
4]. ĻĘĖļ¤¼ļéś ļģĖņØĖņÜöņ¢æ ļ░Å ļ│Ąņ¦Ćļź╝ ņ£äĒĢ┤ ĒĢäņÜöĒĢ£ ņé¼ĒÜīļ│Ąņ¦Ćņé¼ņÖĆ ņÜöņ¢æļ│┤ĒśĖņé¼ņØś ņłśļŖö ņ”ØĻ░ĆĒĢśļŖö ņä£ļ╣äņŖżņØś ņłśņÜöļź╝ ļö░ļØ╝Ļ░Ćņ¦Ć ļ¬╗ĒĢśļŖö ņŗżņĀĢņØ┤ļŗż. ņןĻĖ░ņÜöņ¢æļ│┤ĒŚśĒåĄĻ│äņŚ░ļ│┤ņŚÉ ļö░ļź┤ļ®┤ ņÜöņ¢æņŗ£ņäżĻ│╝ ņ×¼Ļ░ĆļģĖņØĖļ│Ąņ¦Ćņŗ£ņäż ļō▒ņŚÉņä£ ņŗżņĀ£ ņØ╝ĒĢśļŖö ņÜöņ¢æļ│┤ĒśĖņé¼ļŖö 2022ļģä ĻĖ░ņżĆ ņĢĮ 60ļ¦īļ¬ģņØ┤ļ®░, ņØ┤ņżæ 50ļīĆĻ░Ć 30%, 60ļīĆĻ░Ć 50%, 70ļīĆ ņØ┤ņāüņØ┤ 12%ļź╝ ņ░©ņ¦ĆĒĢśņŚ¼ ņÜöņ¢æļ│┤ĒśĖņé¼ņØś ņŚ░ļĀ╣ ņ×Éņ▓┤ļÅä Ļ│ĀļĀ╣ĒÖöļÉśļŖö ņČöņäĖņØ┤ļŗż[
5]. ņןĻĖ░ņÜöņ¢æņŗ£ņäż ļ░Å ņłśĻĖēņ×É ņłśņØś ņ”ØĻ░ĆĒÅŁĻ│╝ ņÜöņ¢æļ│┤ĒśĖņé¼ņØś ņ”ØĻ░ĆĒÅŁņØä ļ╣äĻĄÉĒĢśņśĆņØä ļĢī ļ│┤Ļ▒┤ļ│Ąņ¦ĆļČĆļŖö 2025ļģäĻ▓ĮļČĆĒä░ ņÜöņ¢æļ│┤ĒśĖņé¼ņØś Ļ│ĄĻĖēļ│┤ļŗż ļŹö ļ¦ÄņØĆ ņłśņÜöĻ░Ć ļ░£ņāØĒĢĀ Ļ▓āņØ┤ļØ╝ ņČöņĀĢĒĢśņśĆļŗż. ļŹöņÜ▒ņØ┤ 2022 ņןĻĖ░ņÜöņ¢æņŗżĒā£ņĪ░ņé¼ņŚÉ ļö░ļź┤ļ®┤ Ēśäņ×¼ ņÜöņ¢æņŗ£ņäż ļ░Å ņ×¼Ļ░Ćļ│Ąņ¦Ćņä£ļ╣äņŖżļź╝ ņØ┤ņÜ®ĒĢśļŖö ĒÖśņ×ÉņÖĆ ļ│┤ĒśĖņ×ÉļōżņØĆ ņČöĒøä ņä£ļ╣äņŖżņØś ļ░£ņĀäņé¼ĒĢŁņ£╝ļĪ£ ņ×¼Ļ░ĆĻĖēņŚ¼ ņØ┤ņÜ®ņŗ£Ļ░ä ĒÖĢļīĆ, 1ņØ╝ ņ×¼Ļ░Ćļ│Ąņ¦Ć ļ░®ļ¼ĖĒܤņłś ņ”ØĻ░Ć, ņØśļŻīņØĖļĀź Ļ░ĢĒÖö, ņ╣śļ¦żņĀäļŗ┤ņØĖļĀź ņ”ØĻ░Ć, ņāüņŗ£ ņØ┤ņÜ®Ļ░ĆļŖźĒĢ£ ņØśļŻīņä£ļ╣äņŖż ļō▒ņØä Ēؼļ¦ØĒĢśņŚ¼ ņÜöņ¢æļ│┤ĒśĖņé¼ļéś ņĀäļŗ┤ ņØśļŻīņØĖņØś ņŚģļ¼┤ ĒĢśņżæņØ┤ ņ”ØĻ░ĆĒĢśļŖö ļ░®Ē¢źņ£╝ļĪ£ ļ│Ąņ¦ĆĻ░Ć ņØ┤ļŻ©ņ¢┤ņ¦ł Ļ░ĆļŖźņä▒ņØ┤ Ēü¼ļŗż[
6]. ņŚģļ¼┤ ĒĢśņżæņØ┤ ņ”ØĻ░ĆļÉśļŖö Ļ▓ĮĒ¢ź ņåŹņŚÉņä£ ņÜöņ¢æļ│┤ĒśĖņé¼ļōżņØś ņŚģļ¼┤ļŖö ņÜöņ¢æļō▒ĻĖēĒÅēĻ░ĆņŚÉ ĒĢäņłśņĀüņØĖ ļČäņĢ╝ņØĖ ņŗØņé¼, ņÜ┤ļÅÖĻĖ░ļŖź ņ×¼ĒÖ£, ņĀäņŗĀĻ▒┤Ļ░Ģ Ļ┤Ćļ”¼ ļō▒ņ£╝ļĪ£ ņäĀĒāØĻ│╝ ņ¦æņżæņØ┤ ņØ┤ļŻ©ņ¢┤ņ¦ĆĻ│Ā ņ׳ņ¢┤, ņÜöņ¢æļō▒ĻĖē ĒÅēĻ░ĆņŚÉ Ēü░ ļČĆļČäņØä ņ░©ņ¦ĆĒĢśņ¦Ć ņĢŖļŖö ĻĄ¼Ļ░ĢĻ▒┤Ļ░ĢņØś Ļ▓ĮņÜ░ ĻĘĖ ņżæņÜöļÅäĻ░Ć ņżæļīĆĒĢ©ņŚÉļÅä ļČłĻĄ¼ĒĢśĻ│Ā ņāüļīĆņĀüņ£╝ļĪ£ ņÜ░ņäĀņł£ņ£äĻ░Ć ļÆżļĪ£ ļ░ĆļĀżļéśļŖö ņŗżņĀĢņØ┤ļŗż.
ņØ┤ļ¤¼ĒĢ£ ņāüĒÖ®ņŚÉņä£ ņÜöņ¢æļ│┤ĒśĖņé¼ņØś ĻĘ╝ļ¼┤ ĒÖśĻ▓ĮĻ│╝ ĻĘ╝ņåŹ ņŚ¼ļČĆņŚÉ ļ»Ėņ╣śļŖö ņśüĒ¢źņŚÉ ļīĆĒĢ£ ņŚ░ĻĄ¼Ļ░Ć ĒÖ£ļ░£Ē׳ ņØ┤ļŻ©ņ¢┤ņ¦ĆĻ│Ā ņ׳ļŗż. Ļ▒┤Ļ░Ģļ│┤ĒŚśņŚ░ĻĄ¼ņøÉņØś ņŚ░ĻĄ¼ņŚÉ ļö░ļź┤ļ®┤ ņÜöņ¢æļ│┤ĒśĖņé¼ņØś ņØ┤Ēāłņ£©ņØĆ ņ×¼Ļ░ĆļģĖņØĖļ│Ąņ¦Ćņŗ£ņäżļ│┤ļŗż ņÜöņ¢æņŗ£ņäżņŚÉņä£, Ļ│ĄĻ│ĄĻĖ░Ļ┤Ć ņóģņé¼ņ×ÉņŚÉņä£ļ│┤ļŗż Ļ░£ņØĖ ĻĖ░Ļ┤Ć ņóģņé¼ņ×ÉņŚÉņä£ 2ļ░░ ņØ┤ņāü ļåÆņĢśļŗż[
7]. ņŗżņĀ£ļĪ£ 2021 ņןĻĖ░ņÜöņ¢æļ│┤ĒŚśĒåĄĻ│äņŚ░ļ│┤ņŚÉ ļö░ļź┤ļ®┤ ņÜöņ¢æĻĖ░Ļ░äņØś Ļ│ĄĻ│ĄĻĖ░Ļ┤Ć Ļ│ĄĻĖēļ╣äņ£©ņØĆ 0.9%ņŚÉ ļČłĻ│╝ĒĢśļ®░, Ļ░£ņØĖ ĻĖ░Ļ┤ĆņŚÉņä£ ņÜ┤ņśüĒĢśļŖö Ļ▓ĮņÜ░Ļ░Ć ļīĆļČĆļČäņØ┤ņŚłļŗż. ņØ┤ļŖö ņĀĢļģäņØ┤ ņĪ┤ņ×¼ĒĢśņ¦Ć ņĢŖļŖö ņÜöņ¢æļ│┤ĒśĖņé¼ņØś ĒŖ╣ņä▒ ļō▒Ļ│╝ Ļ▓░ĒĢ®ļÉśņ¢┤ Ļ░£ņØĖ ĻĖ░Ļ┤ĆņŚÉņä£ ļ▓ĢņĀüņØĖ ļ│┤ĒśĖĻ░Ć ļ»ĖĒØĪĒĢśņŚ¼ Ļ│╝ļÅäĒĢ£ ņŚģļ¼┤Ļ░ĢļÅäļéś ņŚģļ¼┤ ĒÖśĻ▓ĮņŚÉ ļģĖņČ£ļÉśļŖö Ļ▓ĮņÜ░Ļ░Ć ļ¦ÄĻĖ░ ļĢīļ¼ĖņØ┤ļØ╝Ļ│Ā ņČöņĀĢļÉśĻ│Ā ņ׳ļŗż. ļśÉĒĢ£ ĒÖśņ×ÉļōżņØś Ļ▒┤Ļ░ĢĻ┤Ćļ”¼ļź╝ ĒÜ©ņ£©ņĀüņ£╝ļĪ£ ņŗżņŗ£ĒĢśĻĖ░ ņ£äĒĢ£ ņĀäļ¼Ėņ¦ĆņŗØņŚÉ ļīĆĒĢ£ ĻĄÉņ£ĪņØ┤ ļ»Ėļ╣äĒĢśņŚ¼ ņÜöņ¢æņŚģļ¼┤ņØś ĒÜ©ņ£©ņä▒ņØ┤ ņĀĆĒĢśļÉ£ļŗżļŖö ņØśĻ▓¼ļÅä ņ׳ņ£╝ļéś, ņĢäņ¦ü ņØ┤ņŚÉ ļīĆĒĢśņŚ¼ļŖö ņäĀĒ¢ēņŚ░ĻĄ¼Ļ░Ć ņØ┤ļŻ©ņ¢┤ņ¦Ćņ¦Ć ņĢŖņØĆ ņŗżņĀĢņØ┤ļŗż.
ļö░ļØ╝ņä£ ļ│Ė ņŚ░ĻĄ¼ņŚÉņä£ļŖö ņÜöņ¢æņŗ£ņäż ļé┤ ĻĘ╝ļ¼┤ņżæņØĖ ņÜöņ¢æļ│┤ĒśĖņé¼ ļ░Å Ļ░äĒśĖņĪ░ļ¼┤ņé¼ļź╝ ļīĆņāüņ£╝ļĪ£ ĻĄ¼Ļ░ĢĻ┤Ćļ”¼ņÖĆ ņŚ░Ļ┤ĆļÉ£ ņŚģļ¼┤ Ļ░ĢļÅäņÖĆ ĻĄÉņ£Ī ĒśäĒÖ®, ĻĘĖļ”¼Ļ│Ā Ēśäņ×¼ Ļ░£ņäĀņØś ĒĢäņÜöņä▒ņØä ļŖÉļü╝ļŖö ĒĢŁļ¬®ņŚÉ ļīĆĒĢ£ ņØĖņŗØņØä ņĪ░ņé¼ĒĢśĻ│Āņ×É ĒĢ£ļŗż. ļśÉĒĢ£ ņÜöņ¢æņŗ£ņäż ņ×ģņøÉĒÖśņ×ÉņØś ņ×ÉĻ░ĆĻ┤Ćļ”¼ Ļ░ĆļŖź ņŚ¼ļČĆņŚÉ ņśüĒ¢źņØä ļ»Ėņ╣śļŖö ņÜöņØĖņØä ņĪ░ņé¼ĒĢśņŚ¼ ņÜöņ¢æņŗ£ņäż ņ×ģņøÉĒÖśņ×ÉņØś Ļ▒┤Ļ░Ģ Ļ┤Ćļ”¼ņŚÉ ļÅäņøĆņØä ņŻ╝Ļ│Āņ×É ĒĢ£ļŗż. ņØ┤ļź╝ ĒåĄĒĢ┤ ņÜöņ¢æņŗ£ņäż Ļ░äĒśĖņØĖļōżņØś ņŚģļ¼┤ Ļ░ĢļÅä ĒśäĒÖ®Ļ│╝ ļ░£ņĀäņØä ņ£äĒĢ┤ ĒĢäņÜöĒĢśļŗżĻ│Ā ļŖÉļü╝ļŖö Ļ▓āņØä ĒÖĢņØĖĒĢśņŚ¼ ņÜöņ¢æņŗ£ņäż Ļ░äĒśĖņØĖļōżņØś ņøÉĒÖ£ĒĢ£ ņŚģļ¼┤ ņłśĒ¢ēĻ│╝ ņÜöņ¢æņä£ļ╣äņŖż ļ░£ņĀäņŚÉ ĻĖ░ņŚ¼ĒĢśĻ│Āņ×É ĒĢ£ļŗż. ļśÉĒĢ£ ņŗ£ņäż ļé┤ Ē¢ēņĀĢņØĖļōżņØä ļīĆņāüņ£╝ļĪ£ Ļ░£ņäĀņØś ĒĢäņÜöņä▒ņØä ļŖÉļü╝ļŖö ĒĢŁļ¬®ņŚÉ ļīĆĒĢ£ ļÅÖņØ╝ĒĢ£ ņäżļ¼ĖņØä ņŗ£Ē¢ēĒĢśņŚ¼ Ļ░äĒśĖņØĖĻ│╝ Ē¢ēņĀĢņØĖ Ļ░ä ņØĖņŗØ ņ░©ņØ┤ļź╝ ĒÖĢņØĖĒĢśĻ│Ā, ņÜöņ¢æņŗ£ņäż ņÜ┤ņśüņŚÉ ņ׳ņ¢┤ņä£ ĒĢ®ņØś ļ░Å ļ░£ņĀä ļ░®Ē¢źņØä ņĀ£ņŗ£ĒĢśļÅäļĪØ ĒĢĀ Ļ▓āņØ┤ļŗż.
ŌģĪ. ļ░®ļ▓Ģ
ļ│Ė ņŚ░ĻĄ¼ņŚÉņä£ļŖö ļīĆĒĢ£ļ»╝ĻĄŁ ņåīņ×¼ņØś 4Ļ││ņØś ņÜöņ¢æņŗ£ņäżņŚÉ ņ×ģņøÉĒĢ£ ĒÖśņ×ÉņÖĆ ņĀäļŗ┤ Ļ░äĒśĖņØĖ ļ░Å ņŗ£ņäż ņÜ┤ņśü Ē¢ēņĀĢņØĖņØä ļīĆņāüņ£╝ļĪ£ ĒĢśņśĆļŗż. ņé¼ņĀäņŚÉ ĒÖśņ×ÉļōżņØś ņĀäļŗ┤ Ļ░äĒśĖņØĖņØä ļīĆņāüņ£╝ļĪ£ ņäżļ¼Ėņ¦Ćļź╝ ļ░░ļČĆĒĢśņŚ¼ ĒÖśņ×ÉļōżņØś ļīĆĒÖöĻ░ĆļŖź ņŚ¼ļČĆ, ļ│┤Ē¢ēĻ░ĆļŖź ņŚ¼ļČĆ, ņ×ÉĻ░ĆĻĄ¼Ļ░ĢĻ┤Ćļ”¼ Ļ░ĆļŖź ņŚ¼ļČĆļź╝ ĒżĒĢ©ĒĢ£ ĻĖ░ļ│ĖņĀüņØĖ ņé¼ĒĢŁņØä ņĪ░ņé¼ĒĢśņśĆļŗż. ņØ┤Ēøä ņłÖļĀ©ļÉ£ ņ╣śĻ│╝ņØśņé¼ 2ņØĖņØ┤ Ļ░üĻ░ü ĒÖśņ×Éļź╝ ļīĆņāüņ£╝ļĪ£ ĻĄ¼Ļ░ĢĻ▓Ćņ¦äņØä ņŗ£Ē¢ēĒĢśņŚ¼ ĻĄ¼Ļ░Ģ Ļ▒┤Ļ░Ģ ĒśäĒÖ®ņØä ĻĖ░ļĪØĒĢśņśĆļŗż. ĻĄ¼ņ▓┤ņĀüņØĖ ĒĢŁļ¬®ņ£╝ļĪ£ļŖö ĻĄŁļ»╝Ļ▒┤Ļ░Ģņśüņ¢æņĪ░ņé¼ ĒĢŁļ¬®ņŚÉ ĒĢ┤ļŗ╣ĒĢśļŖö ĒśäņĪ┤ ņ×ÉņŚ░ņ╣śņĢä ņłś, 20Ļ░£ ņØ┤ņāü ņ×ÉņŚ░ņ╣śņĢä ļ│┤ņ£Āņ£©, ļ¼┤ņ╣śņĢģņ×Éņ£©Ļ│╝ ļŹöļČłņ¢┤ ņłśļ│Ąņ╣śņĢä ņłś, ņÜ░ņŗØņ╣śņĢä ņłś, ņ╣śņŻ╝Ļ▒┤Ļ░Ģ, ĻĄ¼ļé┤ņŚ╝, ĻĄ¼ļé┤ņČ£Ēśł, Ļ┤ĆņĀłņ×ĪņØī, Ļ┤ĆņĀłĒåĄņ”Ø, Ļ░£ĻĄ¼ņןņĢĀ, ĻĄ¼Ļ░ĢĻ▒┤ņĪ░, ņäżĒā£, ņĀäņŗĀņ¦łĒÖś ņ£Āļ¼┤ļź╝ ĻĖ░ļĪØĒĢśņśĆļŗż. ļśÉĒĢ£ Ļ░äĒśĖņØĖĻ│╝ Ē¢ēņĀĢņØĖņØä ļīĆņāüņ£╝ļĪ£ļŖö ļ│äļÅäņØś ņäżļ¼Ėņ¦Ćļź╝ ļ░░ļČĆĒĢśņŚ¼ Ēśäņ×¼ ĻĘ╝ļ¼┤ ĒÖśĻ▓ĮĻ│╝ ĻĄÉņ£ĪņŚÉ ļīĆĒĢ£ ņØĖņŗØņØä ņĪ░ņé¼ĒĢśņśĆļŗż. ĻĄ¼ņ▓┤ņĀüņØĖ ĒĢŁļ¬®ņ£╝ļĪ£ļŖö Ļ│ĄĒåĄņĀüņ£╝ļĪ£ ņŚ░ļĀ╣, ņä▒ļ│ä, ĻĘ╝ļ¼┤Ļ▓ĮļĀźĻ│╝ ļŹöļČłņ¢┤, 6Ļ░Ćņ¦Ć ļ¼ĖĒĢŁņØä ļīĆņāüņ£╝ļĪ£ ĒĢäņÜöņä▒ņŚÉ ļīĆĒĢ£ ņÜ░ņäĀ ņł£ņ£äļź╝ ĒÅēĻ░ĆĒĢśļÅäļĪØ ĒĢśņśĆļŗż. 6Ļ░Ćņ¦Ć ņäżļ¼Ė ĒĢŁļ¬®ņ£╝ļĪ£ļŖö ņ×ģņåīņ×ÉņŚÉ ļīĆĒĢ£ ĻĄ¼Ļ░Ģļ│┤Ļ▒┤ĻĄÉņ£Ī, Ļ░äĒśĖņØĖņŚÉ ļīĆĒĢ£ ĻĄ¼Ļ░Ģļ│┤Ļ▒┤ĻĄÉņ£Ī, Ē¢ēņĀĢņØĖņŚÉ ļīĆĒĢ£ ĻĄ¼Ļ░Ģļ│┤Ļ▒┤ĻĄÉņ£Ī, ņÜöņ¢æņŗ£ņäż ļé┤ņŚÉņä£ ņĀĢĻĖ░ņĀüņØĖ ĻĄ¼Ļ░ĢĻ▓Ćņé¼ ņŗ£Ē¢ē, ņÜöņ¢æņŗ£ņäż ļé┤ņŚÉņä£ ĻĖ░ļ│ĖņĀüņØĖ ņ╣śĻ│╝ņ╣śļŻī ņŗ£Ē¢ē, ņ×ģņåīņ×ÉņŚÉ ļīĆĒĢ£ ĻĄŁĻ░ĆņĀüņØĖ ņ╣śĻ│╝ņ¦äļŻīļ╣ä ņ¦ĆņøÉņØ┤ ņ׳ņ£╝ļ®░, ņØ┤ļōż Ļ░üĻ░üņØä 1ņł£ņ£äļČĆĒä░ 6ņł£ņ£äĻ╣īņ¦Ć ņ░©ļō▒ņØä ļ¦żĻĖ░ļÅäļĪØ ĒĢśņśĆļŗż. ņØ┤Ēøä ņł£ņ£äĻ░Ć ļåÆņØäņłśļĪØ ļåÆņØĆ ņĀÉņłśļź╝ ņ▒ģņĀĢĒĢśņŚ¼ 1ņł£ņ£äļź╝ 6ņĀÉ, 6ņł£ņ£äļź╝ 1ņĀÉņ£╝ļĪ£ ĒÖśņé░ĒĢśņŚ¼ Ļ░ü ļ¼ĖĒĢŁļ│äļĪ£ ņØæļŗĄņ×ÉĻ░Ć ņżæņÜöĒĢśļŗżĻ│Ā ļŖÉļéĆ Ļ░Ćņżæņ╣śļź╝ Ļ│äņé░ĒĢśņśĆļŗż. ļśÉĒĢ£ Ļ░äĒśĖņØĖņØä ļīĆņāüņ£╝ļĪ£ļŖö ņČöĻ░ĆņĀüņ£╝ļĪ£ 1ņØĖļŗ╣ Ļ┤Ćļ”¼ĒĢśļŖö ĒÖśņ×É ņØĖņøÉ ņłś, ĻĄ¼Ļ░ĢĻ▒┤Ļ░Ģ Ļ┤ĆļĀ© ĻĄÉņ£Ī ņØ┤ņłś ņ£Āļ¼┤, ĻĄÉņ£Ī ņØ┤ņłś ņŗ£ ĻĘĖ ņŗ£Ļ░äĻ│╝ Ēܤņłś, ĻĄ¼Ļ░ĢĻ▒┤Ļ░ĢĻ┤ĆļĀ© ņĀĢĻĖ░ņĀü ĻĄÉņ£ĪņØś ĒĢäņÜöņä▒ ņ£Āļ¼┤ļź╝ ņĪ░ņé¼ĒĢśņśĆļŗż.
ĒÅēĻ░Ć ĒĢŁļ¬® ņżæ ļīĆĒÖöĻ░ĆļŖź ņŚ¼ļČĆ, ļ│┤Ē¢ēĻ░ĆļŖź ņŚ¼ļČĆ, ņ×ÉĻ░ĆĻĄ¼Ļ░ĢĻ┤Ćļ”¼ Ļ░ĆļŖź ņŚ¼ļČĆļŖö ņĀĢņāüĻĖ░ļŖź, ļ»ĖĒØĪ, ļČłĻ░ĆļŖźņØś 3ļŗ©Ļ│äļĪ£ ļČäļźśĒĢśņśĆļŗż. ņāüņäĖ ĻĖ░ņżĆņØś Ļ▓ĮņÜ░ ņĀĢņāüĻĖ░ļŖźņØĆ ĒÖśņ×É ņŖżņŖżļĪ£ ļ¼┤ļ”¼ņŚåņØ┤ Ļ░ĆļŖźĒĢ£ ņłśņżĆ, ļ»ĖĒØĪņØĆ ņ¢┤ļŖÉņĀĢļÅä ņŖżņŖżļĪ£ ĻĖ░ļŖźņØ┤ Ļ░ĆļŖźĒĢśļéś ņÜöņ¢æļ│┤ĒśĖņé¼ņØś ļ│┤ņĪ░Ļ░Ć ļŗżņåī ĒĢäņÜöĒĢ£ Ļ▓ĮņÜ░, ļČłĻ░ĆļŖźņØĆ ņÜöņ¢æļ│┤ĒśĖņé¼ņØś ļ│┤ņĪ░ ņŚåņØ┤ļŖö ĻĖ░ļŖźņØ┤ ņÖäņĀäĒ׳ ļČłĻ░ĆļŖźĒĢ£ ņłśņżĆņ£╝ļĪ£ ĒÅēĻ░ĆĒĢśņśĆļŗż.
ņłśņ¦æļÉ£ ņ×ÉļŻīņØś ĒåĄĻ│äļČäņäØņØä ņ£äĒĢśņŚ¼ļŖö SPSS ver 25(SPSS inc., Chicago, IL, USA)Ļ░Ć ņé¼ņÜ®ļÉśņŚłļŗż. ĻĖ░ņłĀĒåĄĻ│äļź╝ ĒåĄĒĢ┤ ĻĖ░ļ│ĖņĀüņØĖ ļ│ĆņłśļōżņØś ĒÅēĻĘĀĻ│╝ Ēæ£ņżĆĒÄĖņ░©ļź╝ Ļ│äņé░ĒĢśņśĆļŗż. ļ│ĆņłśļōżņØś ņĀĢĻĘ£ņä▒ Ļ▓ĆņĀĢņØä ņ£äĒĢ£ Shapiro-WIlk ņĀĢĻĘ£ņä▒ Ļ▓ĆņĀĢņØ┤ ņé¼ņÜ®ļÉśņŚłļŗż. ņŚ░ņåŹĒśĢ ļ│ĆņłśĻ░Ć ĒżĒĢ©ļÉ£ Ļ▓ĮņÜ░ ņŚ░ņåŹĒśĢ ļ│Ćņłś ĒÅēĻĘĀļ╣äĻĄÉļź╝ ĒåĄĒĢ£ ņŚ░Ļ┤Ćņä▒ Ļ▓ĆņĀĢņØä ņ£äĒĢśņŚ¼ Mann-Whitney testņÖĆ Kruskal-Wallis testĻ░Ć ņé¼ņÜ®ļÉśņŚłļŗż. ļ¬ģļ¬®ļ│Ćņłś Ļ░ä ņŚ░Ļ┤Ćņä▒ Ļ▓ĆņĀĢņØä ņ£äĒĢśņŚ¼ļŖö ļ¬ģļ¬®ļ│ĆņłśņØś ļČäļźśĻĖ░ņżĆ ņłśņŚÉ ļö░ļØ╝ņä£ Pearson ņ╣┤ņØ┤ņĀ£Ļ│▒ Ļ▓ĆņĀĢ, Fisher ņĀĢĒÖĢĻ▓ĆņĀĢ, Fisher-Freeman-Halton ņĀĢĒÖĢĻ▓ĆņĀĢņØ┤ ņé¼ņÜ®ļÉśņŚłļŗż.
ļ│Ė ņŚ░ĻĄ¼ņŚÉņä£ ļīĆņāüņ×ÉņŚÉĻ▓ī Ē¢ēĒĢ┤ņ¦ĆļŖö ļ¬©ļōĀ ņäżļ¼Ė, Ļ▓Ćņ¦ä ļō▒ņØś ņŚ░ĻĄ¼ĒÖ£ļÅÖņØĆ Ļ▓ĮĒؼļīĆĒĢÖĻĄÉ ņ╣śĻ│╝ļ│æņøÉ ņŚ░ĻĄ¼ņ£żļ”¼ņ£äņøÉĒÜīņØś ņŖ╣ņØĖ ņĀłņ░©ļź╝ ļ░øņØĆ Ēøä ņ¦äĒ¢ēļÉśņŚłļŗż(IRB number: KH-DT22029).
Ōģó. Ļ▓░Ļ│╝
1. .ņÜöņĢÖņŗ£ņäż ņ×ģņøÉĒÖśņ×ÉņØś ļīĆĒÖöĻ░ĆļŖź, ļ│┤Ē¢ēĻ░ĆļŖź ļ░Å ņ×ÉĻ░Ć ĻĄ¼Ļ░ĢĻ┤Ćļ”¼ Ļ░ĆļŖź ņŚ¼ļČĆ
1-1. ĻĖ░ņ┤łĒåĄĻ│ä
ļ│Ė ņŚ░ĻĄ¼ņŚÉņä£ ņĪ░ņé¼ļÉ£ 164ļ¬ģņØś ņÜöņ¢æņŗ£ņäż ņ×ģņøÉĒÖśņ×ÉļōżņØś ļīĆĒÖöĻ░ĆļŖźņŚ¼ļČĆ, ļ│┤Ē¢ēĻ░ĆļŖźņŚ¼ļČĆ ļ░Å ņ×ÉĻ░Ć ĻĄ¼Ļ░ĢĻ┤Ćļ”¼ Ļ░ĆļŖźņŚ¼ļČĆ(ņØ┤ĒĢś ņ×ÉĻ░ĆņāØĒÖ£ļŖźļĀź)ļŖö ļŗżņØīĻ│╝ Ļ░Öļŗż(
Table 1).
ļīĆĒÖöĻ░ĆļŖź ņŚ¼ļČĆņŚÉņä£ļŖö Ļ░ü ĻĄ░ņØś ļ╣äņ£©ņØ┤ ļ╣äņŖĘĒĢśņśĆņ£╝ļéś, ļ│┤Ē¢ēĻ░ĆļŖź ņŚ¼ļČĆ ļ░Å ņ×ÉĻ░Ć ĻĄ¼Ļ░ĢĻ┤Ćļ”¼ Ļ░ĆļŖź ņŚ¼ļČĆņŚÉņä£ļŖö ļ»ĖĒØĪ ļ░Å ļČłĻ░ĆļŖźĒĢ£ ĻĄ░ņØ┤ ļÜ£ļĀĘĒĢśĻ▓ī ļåÆņĢśļŗż. ĒŖ╣Ē׳ ņ×ÉĻ░Ć ļ│┤Ē¢ēņØ┤ ņÖäņĀäĒ׳ ļČłĻ░ĆļŖźĒĢ£ ĻĄ░ņØ┤ 61%ļĪ£ ņĀłļ░ś ņØ┤ņāüņØä ņ░©ņ¦ĆĒĢśņŚ¼, ņÜöņ¢æņŗ£ņäż ņ×ģņøÉĒÖśņ×ÉņØś ļŗżņłśĻ░Ć ņ╣©ņāü ņāØĒÖ£ņØä ĒĢśĻ│Ā ņ׳ņØīņØ┤ ĒÖĢņØĖļÉśņŚłļŗż.
1-2. ņāüĻ┤Ćņä▒ ļČäņäØ
ļ│Ė ņŚ░ĻĄ¼ņŚÉņä£ ņĪ░ņé¼ļÉ£ ņÜöņ¢æņŗ£ņäż ņ×ģņøÉĒÖśņ×ÉļōżņØś ņ×ÉĻ░ĆņāØĒÖ£ļŖźļĀźĻ│╝ ĒåĄĻ│äņĀüņ£╝ļĪ£ ņ£ĀņØśļ»ĖĒĢ£ ņŚ░Ļ┤Ćņä▒ņØä ļ│┤ņØ┤ļŖö ĒĢŁļ¬®ņØĆ ļŗżņØīĻ│╝ Ļ░Öļŗż(
Table 2).
ļīĆĒÖöĻ░ĆļŖź ņŚ¼ļČĆ, ļ│┤Ē¢ēĻ░ĆļŖź ņŚ¼ļČĆ, ņ×ÉĻ░Ć ĻĄ¼Ļ░ĢĻ┤Ćļ”¼ Ļ░ĆļŖź ņŚ¼ļČĆļŖö ņāüĒśĖ Ļ░ä ļ¬©ļæÉ ņ£ĀņØśļ»ĖĒĢ£ ņāüĻ┤ĆĻ┤ĆĻ│äĻ░Ć ņĪ┤ņ×¼ĒĢśņśĆļŗż(p<0.0001). ļśÉĒĢ£ ļ¬©ļōĀ ņ×ÉĻ░ĆĻ┤Ćļ”¼Ļ░ĆļŖźņŚ¼ļČĆļŖö ĒÖśņ×ÉņØś ņÜöņ¢æļō▒ĻĖēĻ│╝ ņ£ĀņØśļ»ĖĒĢ£ ņŚ░Ļ┤Ćņä▒ņØ┤ ņĪ┤ņ×¼ĒĢśņśĆļŗż(p<0.0001). ļīĆĒÖöĻ░ĆļŖź ņŚ¼ļČĆņØś Ļ▓ĮņÜ░ļŖö 20Ļ░£ņØ┤ņāü ņ×ÉņŚ░ņ╣śņĢä ļ│┤ņ£Āņ£©Ļ│╝ ņāüĻ┤ĆĻ┤ĆĻ│äĻ░Ć ņĪ┤ņ×¼ĒĢśņśĆņ£╝ļ®░, ņé¼ĒøäļČäņäØņŚÉņä£ ņĀĢņāüĻĄ░ņØ┤ ļ»ĖĒØĪĻĄ░ņŚÉ ļ╣äĒĢ┤ 20Ļ░£ņØ┤ņāü ņ×ÉņŚ░ņ╣śņĢä ļ│┤ņ£Āņ£©ņØ┤ ņ£ĀņØśļ»ĖĒĢśĻ▓ī ļåÆņĢśļŗż(p=0.027, adj.p=0.027).
2. ņÜöņ¢æņŗ£ņäż Ļ░äĒśĖņØĖĻ│╝ Ē¢ēņĀĢņØĖņØś ņØĖņŗØņĪ░ņé¼
2-1. ĻĖ░ņ┤łĒåĄĻ│ä
ļ│Ė ņŚ░ĻĄ¼ņŚÉņä£ ņĪ░ņé¼ļÉ£ ņÜöņ¢æņŗ£ņäż ņóģņé¼ņ×ÉļŖö Ļ░äĒśĖņØĖņØ┤ 34ļ¬ģ, Ē¢ēņĀĢņØĖņØ┤ 17ļ¬ģņØ┤ņŚłņ£╝ļ®░, ņØ┤ļōżņØś ĒśäĒÖ® ļ░Å ņØĖņŗØĻ│╝ Ļ┤ĆļĀ©ļÉ£ ņäżļ¼ĖņĪ░ņé¼ Ļ▓░Ļ│╝ļŖö ļŗżņØīĻ│╝ Ļ░Öļŗż(
Table 3,
4).
ĻĘ╝ļ¼┤Ļ▓ĮļĀźņØś Ļ▓ĮņÜ░ ņĄ£ņåīĻ░ÆņØ┤ 1Ļ░£ņøö, ņĄ£ļīĆĻ░ÆņØ┤ 120Ļ░£ņøöļĪ£ Ēæ£ņżĆĒÄĖņ░©Ļ░Ć 49.03ņŚÉ ļŗ¼ĒĢ┤ Ļ░äĒśĖņØĖ Ļ░ä ĒÄĖņ░©Ļ░Ć Ēü░ ĒÄĖņØ┤ņŚłļŗż. Ļ░äĒśĖņØĖ ņżæ 2ļ¬ģņØä ņĀ£ņÖĖĒĢśĻ│ĀļŖö ņĀäļČĆ ņÜöņ¢æļ│æņøÉ ņ×ģņøÉĒÖśņ×ÉņØś ĻĄ¼Ļ░ĢĻ┤Ćļ”¼ļź╝ ņŗ£Ē¢ēĒĢśĻ│Ā ņ׳ņŚłņ£╝ļ®░, Ļ░äĒśĖņØĖ 1ņØĖļŗ╣ ĒÅēĻĘĀ 7.47ļ¬ģņØś ĒÖśņ×Éļź╝ Ļ┤Ćļ”¼ĒĢśĻ│Ā ņ׳ņŚłļŗż. ņØ┤ļōż ņĀäņøÉņØ┤ ĒÖśņ×É ļīĆņāüņ£╝ļĪ£ ņ¢æņ╣śņ¦łņØä ņŗ£Ē¢ēĒĢśĻ│Ā ņ׳ņŚłņ£╝ļ®░, ļ¼┤ņ╣śņĢģ ĒÖśņ×ÉņØś Ļ▓ĮņÜ░ņŚÉļÅä Ļ▒░ņ”ł ļ░Å ņ╣śņĢĮņØä ņØ┤ņÜ®ĒĢ£ ņ╣śņŻ╝Ļ┤Ćļ”¼ļź╝ ņŗ£Ē¢ēĒĢ£ļŗżĻ│Ā ļŗĄĒĢśņśĆļŗż. ĻĘĖļ¤¼ļéś ĻĄ¼Ļ░ĢĻ┤Ćļ”¼ ĻĄÉņ£Ī ņłśļŻī Ļ▓ĮĒŚśņ×ÉļŖö 10ļ¬ģ(29.4%)ņŚÉ ļČłĻ│╝ĒĢśņśĆņ£╝ļ®░, ņØ┤ ņżæ ņĀĢĻĖ░ņĀüņ£╝ļĪ£ ĻĄÉņ£ĪņØä ņłśļŻīļ░øļŖö ņØĖņøÉņØĆ 7ļ¬ģņ£╝ļĪ£ ņĀäņ▓┤ņØś 20.6%ņŚÉ ļČłĻ│╝ĒĢśņśĆļŗż. ĻĘĖļ¤╝ņŚÉļÅä ļČłĻĄ¼ĒĢśĻ│Ā 28ļ¬ģ(82.4%)ņŚÉ ĒĢ┤ļŗ╣ĒĢśļŖö ņØĖņøÉņØ┤ ņĀĢĻĖ░ņĀüņØĖ ĻĄ¼Ļ░ĢĻ┤Ćļ”¼ ĻĄÉņ£ĪņØś ĒĢäņÜöņä▒ņØä ņØĖņ¦ĆĒĢ£ļŗżĻ│Ā ļŗĄĒĢśņśĆļŗż. ĒĢ£ĒÄĖ ĻĄ¼Ļ░ĢĻ┤Ćļ”¼ ņŚģļ¼┤ņŚÉ ļīĆĒĢ£ ļ¦īņĪ▒ļÅäļŖö ņĀäļ░śņĀüņ£╝ļĪ£ ļåÆĻ▓ī Ļ┤Ćņ░░ļÉśņŚłņ£╝ļéś, ĻĄ¼Ļ░ĢĻ┤Ćļ”¼ ņŚģļ¼┤ņØś Ēö╝ļĪ£ļÅäĻ░Ć ļåÆļŗżĻ│Ā ļŗĄĒĢ£ ņØĖņøÉņØ┤ 10ļ¬ģ(29.4%)ļĪ£ ņāüļŗ╣ņłśļź╝ ņ░©ņ¦ĆĒĢśĻ│Ā ņ׳ņŚłļŗż. ļśÉĒĢ£ ļ¦īņĪ▒ļÅä ļ░Å Ēö╝ļĪ£ļÅäņÖĆ ļ│äĻ░£ļĪ£ 26ļ¬ģ(76.5%)ņŚÉ ļŗ¼ĒĢśļŖö Ļ░äĒśĖņØĖņØ┤ Ēśäņ×¼ņØś ņ×ģņåīņ×É ĻĄ¼Ļ░ĢĻ┤Ćļ”¼ ļ░®ņŗØņŚÉ ļīĆĒĢ┤ ļŹö ļ░£ņĀäņØ┤ ĒĢäņÜöĒĢśļŗżĻ│Ā ĒśĖņåīĒĢśņśĆļŗż.
ņäżļ¼ĖņĪ░ņé¼ Ļ▓░Ļ│╝ņØś Ļ▓ĮņÜ░ Ļ░äĒśĖņØĖņØĆ ņÜöņ¢æņøÉ ņĢłņŚÉņä£ ņĀĢĻĖ░ņĀüņØĖ ĻĄ¼Ļ░ĢĻ▓Ćņé¼ņØś ĒĢäņÜöņä▒ņØä Ļ░Ćņן ļåÆĻ▓ī ĒÅēĻ░ĆĒĢśņśĆņ£╝ļ®░, ļ░śļīĆļĪ£ Ē¢ēņĀĢņØĖņØä ļīĆņāüņ£╝ļĪ£ ĒĢ£ ĻĄ¼Ļ░Ģļ│┤Ļ▒┤ĻĄÉņ£ĪņØś ĒĢäņÜöņä▒ņØä Ļ░Ćņן ļé«Ļ▓ī ĒÅēĻ░ĆĒĢśņśĆļŗż. ņØ┤ļŖö Ē¢ēņĀĢņØĖņØä ļīĆņāüņ£╝ļĪ£ ĒĢ£ ņäżļ¼ĖņĪ░ņé¼ Ļ▓░Ļ│╝ņÖĆ ņāüļ░śļÉśļŖö ļČĆļČäņ£╝ļĪ£, Ē¢ēņĀĢņØĖņØĆ ņŚŁņ£╝ļĪ£ Ē¢ēņĀĢņØĖņØä ļīĆņāüņ£╝ļĪ£ ĒĢ£ ĻĄ¼Ļ░Ģļ│┤Ļ▒┤ĻĄÉņ£ĪņØś ĒĢäņÜöņä▒ņØä Ļ░Ćņן ļåÆĻ▓ī ĒÅēĻ░ĆĒĢśņśĆņ£╝ļ®░ ņÜöņ¢æņøÉ ņĢłņŚÉņä£ ņĀĢĻĖ░ņĀüņØĖ ĻĄ¼Ļ░ĢĻ▓Ćņé¼ņØś ĒĢäņÜöņä▒ņØä Ļ░Ćņן ļé«Ļ▓ī ĒÅēĻ░ĆĒĢśņśĆļŗż.
2-2. ņāüĻ┤Ćņä▒ ļČäņäØ
ņÜöņ¢æņŗ£ņäż ļé┤ Ļ░äĒśĖņØĖ ļ░Å Ē¢ēņĀĢņØĖņØä ļīĆņāüņ£╝ļĪ£ ĒĢ£ ņäżļ¼ĖņĪ░ņé¼ Ļ▓░Ļ│╝ ļé┤ņŚÉņäĖ ĒåĄĻ│äņĀüņ£╝ļĪ£ ņ£ĀņØśļ»ĖĒĢ£ ņŚ░Ļ┤Ćņä▒ņØä ļ│┤ņØ┤ļŖö ĒĢŁļ¬®ņØĆ ļŗżņØīĻ│╝ Ļ░Öļŗż(
Table 5).
Ļ░äĒśĖņØĖ ļé┤ņŚÉņä£ļŖö ņĀĢĻĖ░ņĀüņØĖ ĻĄ¼Ļ░ĢĻ┤Ćļ”¼ ĻĄÉņ£ĪņØ┤ ĒĢäņÜöĒĢśļŗżĻ│Ā ļŖÉļü╝ļŖöņ¦ĆņØś ņŚ¼ļČĆņÖĆ ņŚ░ļĀ╣ļīĆ ļ░Å ĻĘ╝ļ¼┤Ļ▓ĮļĀźņØ┤ ĒåĄĻ│äņĀüņ£╝ļĪ£ ņ£ĀņØśĒĢ£ ņŚ░Ļ┤Ćņä▒ņØä ļ│┤ņśĆļŗż. ņäżļ¼ĖņĪ░ņé¼ ļé┤ņŚÉņä£ļŖö Ļ░äĒśĖņØĖĻ│╝ Ē¢ēņĀĢņØĖ Ļ░üĻ░üņØś ĻĘĖļŻ╣ņŚÉņä£ ĻĘĖļŻ╣ ļé┤ ļ¼ĖĒĢŁ Ļ░ä ĒåĄĻ│äņĀüņ£╝ļĪ£ ņ£ĀņØśļ»ĖĒĢ£ ņ░©ņØ┤ļź╝ ļ│┤ņØ┤ļŖö ļ¼ĖĒĢŁņØ┤ ņĪ┤ņ×¼ĒĢśņśĆļŗż. Ļ░äĒśĖņØĖņŚÉņä£ļŖö ņĀäņ▓┤ ļīĆņāü ļ░Å 60ņäĖ ļ»Ėļ¦ī ĻĘĖļŻ╣ņŚÉņä£ C ļ¼ĖĒĢŁļ│┤ļŗż D ļ¼ĖĒĢŁņØ┤ ņżæņÜöĒĢśļŗżĻ│Ā ĒÅēĻ░ĆĒĢ£ ņØĖņøÉņØ┤ ņ£ĀņØśļ»ĖĒĢśĻ▓ī ļ¦ÄņĢśļŗż(Ļ░ü p=0.020, 0.036, adj. p=0.033). Ē¢ēņĀĢņØĖņŚÉņä£ļŖö ļ░śļ®┤ ņĀäņ▓┤ņĀüņ£╝ļĪ£ C ļ¼ĖĒĢŁņØ┤ D ļ¼ĖĒĢŁņŚÉ ļ╣äĒĢ┤ ņżæņÜöļÅäĻ░Ć ļåÆļŗżĻ│Ā ĒÅēĻ░ĆĒĢśņśĆņ£╝ļ®░, ņČöĻ░ĆņĀüņ£╝ļĪ£ A ļ¼ĖĒĢŁņØś ņżæņÜöļÅä ņŚŁņŗ£ D ļ¼ĖĒĢŁņŚÉ ļ╣äĒĢ┤ ļåÆļŗżĻ│Ā ĒÅēĻ░ĆĒĢśņśĆļŗż. ņŗżņĀ£ļĪ£ C ļ¼ĖĒĢŁņŚÉ ļīĆĒĢ£ Ļ░äĒśĖņØĖĻ│╝ Ē¢ēņĀĢņØĖ Ļ░ä ņĀÉņłś ļČäĒżņØś ņ░©ņØ┤ļŖö ĒåĄĻ│äņĀüņ£╝ļĪ£ ņ£ĀņØśļ»ĖĒĢ£ Ļ▓āņ£╝ļĪ£ ļō£ļ¤¼ļé¼ļŗż (p=0.047). ĻĘĖļ¤¼ļéś Ļ░äĒśĖņØĖ ļ░Å Ē¢ēņĀĢņØĖņØś Ļ▓░Ļ│╝ļź╝ ĒåĄĒĢ®ĒĢ£ ņĀäņ▓┤ ņäżļ¼ĖņĪ░ņé¼ Ļ▓░Ļ│╝ņŚÉņä£ļŖö ņĀäļ░śņĀüņ£╝ļĪ£ C ļ¼ĖĒĢŁņØś ņżæņÜöļÅäĻ░Ć ņāüļīĆņĀüņ£╝ļĪ£ ļ¢©ņ¢┤ņ¦ĆļŖö Ļ▓ĮĒ¢źņØä ļ│┤ņśĆņ£╝ļ®░, D, E, F ļ¼ĖĒĢŁņØä ņāüļīĆņĀüņ£╝ļĪ£ ļŹö ņżæņÜöĒĢśĻ▓ī ĒÅēĻ░ĆĒĢśņśĆļŗż.
ŌģŻ. Ļ│Āņ░░
ļ│Ė ņŚ░ĻĄ¼ņŚÉņä£ļŖö ņÜöņ¢æņøÉņÖĆ ņÜöņ¢æļ│æņøÉ ļō▒ ņÜöņ¢æņŗ£ņäż ļé┤ ņ×ģņøÉĒÖśņ×ÉņØś ņ×ÉĻ░ĆņāØĒÖ£ļŖźļĀźĻ│╝ ņØ┤ņÖĆ ņāüĻ┤ĆĻ┤ĆĻ│äļź╝ Ļ░Ćņ¦ĆļŖö ĒĢŁļ¬®ņØä ņĪ░ņé¼ĒĢśĻ│Ā, ĻĄ¼Ļ░ĢĻ┤Ćļ”¼ņŚÉ ņ׳ņ¢┤ņä£ ņÜöņ¢æņŗ£ņäż ļé┤ Ļ░äĒśĖņØĖĻ│╝ Ē¢ēņĀĢņØĖņØś ņŚģļ¼┤ ĒśäĒÖ® ļ░Å Ļ░ĢļÅäņÖĆ ļŹöļČłņ¢┤ ĻĄ¼Ļ░ĢĻ┤Ćļ”¼ņŚÉ ļīĆĒĢ£ ņØĖņŗØņØä ņĪ░ņé¼ĒĢśņśĆļŗż.
ņÜöņ¢æņŗ£ņäż ļé┤ ņ×ģņøÉĒÖśņ×ÉļōżņØś ļīĆĒÖöĻ░ĆļŖź ņŚ¼ļČĆ, ļ│┤Ē¢ēĻ░ĆļŖź ņŚ¼ļČĆ, ņ×ÉĻ░Ć ĻĄ¼Ļ░ĢĻ┤Ćļ”¼ Ļ░ĆļŖź ņŚ¼ļČĆļŖö ņāüĒśĖ Ļ░ä ļ░ĆņĀæĒĢ£ ņŚ░Ļ┤Ćņä▒ņØä ļ│┤ņśĆļŗż. ļģĖņØĖņØś ņ×ÉĻ░Ć ĻĄ¼Ļ░ĢĻ┤Ćļ”¼ļŖö Ļ░Ćļ▓╝ņÜ┤ ņÜ┤ļÅÖ ĒÖ£ļÅÖņŚÉ ĒĢ┤ļŗ╣ļÉśĻĖ░ ļĢīļ¼ĖņŚÉ, ļ│┤Ē¢ēĒĢśņŚ¼ ĒÖöņןņŗżļĪ£ ņØ┤ļÅÖĒĢ£ Ēøä ņ×ÉĻ░Ć ĻĄ¼Ļ░ĢĻ┤Ćļ”¼ļź╝ ņŗ£Ē¢ēĒĢśņŚ¼ņĢ╝ ĒĢśļ»ĆļĪ£ ņŗĀņ▓┤ņĀü ĻĖ░ļŖźĻ│╝ ļ░ĆņĀæĒĢ£ ņŚ░Ļ┤Ćņä▒ņØä Ļ░Ćņ¦ł Ļ▓āņØ┤ļŗż. ļśÉĒĢ£ ņ×ÉĻ░Ć ĻĄ¼Ļ░ĢĻ┤Ćļ”¼ļŖö ĒāĆņØĖņŚÉ ņØśĒĢ£ ĻĄ¼Ļ░ĢĻ┤Ćļ”¼ņŚÉ ļ╣äĒĢ┤ ņ×ÉņŻ╝, ļŹö Ļ╝╝Ļ╝╝ĒĢśĻ▓ī ņŗ£Ē¢ē Ļ░ĆļŖźĒĢśļ»ĆļĪ£ ņØ┤ļŖö ņ╣śņĢäĻ▒┤Ļ░ĢņØä ĒżĒĢ©ĒĢ£ ĻĄ¼Ļ░Ģņ£äņāØ Ļ┤Ćļ”¼ņŚÉ ļÅäņøĆņØä ņŻ╝Ļ│Ā, ņØ┤ļĪ£ ņØĖĒĢ┤ ĒÖĢļ│┤ļÉ£ Ē¢źņāüļÉ£ ĻĄ¼Ļ░Ģņ£äņāØņØĆ ņĀĆņ×æļŖźņØä Ē¢źņāüņŗ£ņ╝£ ļīĆĒÖöļŖźļĀźņØä ĒżĒĢ©ĒĢ£ ņØĖņ¦ĆĻĖ░ļŖź ņ£Āņ¦ĆņŚÉ ĻĖ░ņŚ¼ĒĢĀ Ļ▓āņØ┤ļŗż[8~10]. ļśÉĒĢ£ Ļ│Āļō▒ĻĖē ņÜöņ¢æņŗ£ņäż ņ×ģņøÉĒÖśņ×ÉņŚÉņä£ ļīĆĒÖöļŖźļĀźĻ│╝ ļ│┤Ē¢ēļŖźļĀźņØ┤ ņĀĆĒĢśļÉśļŖö Ļ▓āĻ│╝ ļŹöļČłņ¢┤ ņ×ÉĻ░Ć ĻĄ¼Ļ░ĢĻ┤Ćļ”¼ ļŖźļĀź ņŚŁņŗ£ ļ¢©ņ¢┤ņ¦äļŗżļŖö ĒåĄĻ│äņĀü ņŚ░Ļ┤Ćņä▒ņØ┤ ĒÖĢņØĖļÉśņŚłņ£╝ļ»ĆļĪ£, ņ×ÉĻ░Ć ĻĄ¼Ļ░ĢĻ┤Ćļ”¼ ņŚ¼ļČĆĻ░Ć ņĀäļ░śņĀüņØĖ ļģĖņØĖĻ▒┤Ļ░ĢņŚÉ ņśüĒ¢źņØä ļ»Ėņ╣£ļŗżĻ│Ā ļ│╝ ņłś ņ׳ņØä Ļ▓āņØ┤ļŗż. ļö░ļØ╝ņä£ ņØ┤ļŖö ĻĖ░ņĪ┤ ņÜöņ¢æļō▒ĻĖēĒīÉņĀĢ ĻĖ░ņżĆņŚÉ ĒżĒĢ©ļÉśņ¢┤ ņ׳ļŖö ļīĆĒÖöĻ░ĆļŖź ņŚ¼ļČĆ ļ░Å ļ│┤Ē¢ēĻ░ĆļŖź ņŚ¼ļČĆņÖĆ ņ×ÉĻ░Ć ĻĄ¼Ļ░ĢĻ┤Ćļ”¼ Ļ░ĆļŖź ņŚ¼ļČĆĻ░Ć ņä£ļĪ£ ņŚ░Ļ┤ĆļÉśņ¢┤ ņ׳ļŗżļŖö Ļ▓āņØä ņØśļ»ĖĒĢśĻĖ░ ļĢīļ¼ĖņŚÉ, ņÜöņ¢æļō▒ĻĖēĒīÉņĀĢ ĻĖ░ņżĆņŚÉ ņ¢æņ╣śņ¦ł ņØ┤ņÖĖņØś ņ×ÉĻ░Ć ĻĄ¼Ļ░ĢĻ┤Ćļ”¼ ņŚ¼ļČĆ ĒīÉņĀĢ ĻĖ░ņżĆņØä ņČöĻ░ĆĒĢśļŖö Ļ▓āņŚÉ ļīĆĒĢ£ ņØ┤ļĪĀņĀü ĻĘ╝Ļ▒░Ļ░Ć ļÉĀ Ļ▓āņØ┤ļŗż.
ņÜöņ¢æņŗ£ņäż ļé┤ Ļ░äĒśĖņØĖņØś ļīĆļŗżņłśļŖö ņ×ģņøÉĒÖśņ×ÉņØś ĻĄ¼Ļ░ĢĻ┤Ćļ”¼ļź╝ ĒśäņןņŚÉņä£ ņŗ£Ē¢ēĒĢśĻ│Ā ņ׳ņŚłļŗż. ĻĘĖļ¤¼ļéś ĻĄ¼Ļ░ĢĻ┤Ćļ”¼ Ļ┤ĆļĀ© ĻĄÉņ£ĪņØä ņłśļŻīĒĢ£ ņØĖņøÉņłśļŖö ņ▒ä ņĀłļ░śņØ┤ ļÉśņ¦Ć ņĢŖņ£╝ļ®░, ņĀĢĻĖ░ņĀüņ£╝ļĪ£ ĻĄÉņ£ĪņØä ņłśļŻīĒĢśļŖö ņØĖņøÉ ņŚŁņŗ£ ņĢĮ 20%ņŚÉ ļČłĻ│╝ĒĢśņśĆļŗż. ļŗżņłśņØś Ļ░äĒśĖņØĖļōżņØ┤ ĻĄ¼Ļ░ĢĻ┤Ćļ”¼ Ļ┤ĆļĀ© ĻĄÉņ£ĪņØś ĒĢäņÜöņä▒ņØä ņØĖņ¦ĆĒĢśĻ│Ā ņ׳ņŚłĻ│Ā, ņŗżņĀ£ļĪ£ ņäżļ¼ĖņĪ░ņé¼ņŚÉņä£ ĻĄ¼Ļ░Ģļ│┤Ļ▒┤ĻĄÉņ£Ī Ļ┤ĆļĀ© ĒĢŁļ¬® ņżæ Ļ░äĒśĖņØĖļōżņØĆ Ļ░äĒśĖņØĖ ļīĆņāüņØś ĻĄ¼Ļ░Ģļ│┤Ļ▒┤ĻĄÉņ£ĪņØ┤ ņżæņÜöĒĢśļŗżĻ│Ā ņØæļŗĄĒĢ£ ļ╣äņ£©ņØ┤ ļåÆņĢśĻĖ░ ļĢīļ¼ĖņŚÉ, ĻĄÉņ£Ī ņłśņÜöņŚÉ ļ░£ļ¦×ņČöņ¢┤ Ļ░äĒśĖņØĖņØä ļīĆņāüņ£╝ļĪ£ ĒĢ£ ņČ®ļČäĒĢ£ ĻĄ¼Ļ░ĢĻ┤Ćļ”¼ Ļ┤ĆļĀ© ĻĄÉņ£ĪņØ┤ ņØ┤ļŻ©ņ¢┤ņĀĖņĢ╝ ĒĢĀ Ļ▓āņØ┤ļŗż.
ĒĢ£ĒÄĖ Ļ░äĒśĖņØĖļōżņØś ļīĆļŗżņłśļŖö Ēśäņ×¼ņØś ĻĄ¼Ļ░ĢĻ┤Ćļ”¼ ņŚģļ¼┤ ņ×Éņ▓┤ļź╝ ļ¦īņĪ▒ĒĢśĻ│Ā ņ׳Ļ▒░ļéś ļé®ļōØ Ļ░ĆļŖźĒĢ£ ņłśņżĆņØ┤ļØ╝Ļ│Ā ĒÅēĻ░ĆĒĢśņśĆņ£╝ļéś, ņŚģļ¼┤ Ļ░ĢļÅä ņĖĪļ®┤ņŚÉņä£ļŖö ĻĄ¼Ļ░ĢĻ┤Ćļ”¼ ņŚģļ¼┤ Ēö╝ļĪ£ļÅäĻ░Ć ļåÆļŗżĻ│Ā ĒÅēĻ░ĆĒĢ£ ņØĖņøÉņØ┤ ņĢĮ 30%ļĪ£ ļ¦īņĪ▒ļÅäņŚÉ ļ╣äĒĢ┤ ļåÆņØĆ ņłśņżĆņØ┤ņŚłļŗż. ļśÉĒĢ£ ļ¦īņĪ▒ļÅäņÖĆļŖö ļ▓īĻ░£ļĪ£ ņĢĮ 76%ņŚÉ ļŗ¼ĒĢśļŖö ļŗżņłśņØś Ļ░äĒśĖņØĖļōżņØ┤ Ēśäņ×¼ ĻĄ¼Ļ░ĢĻ┤Ćļ”¼ ņŚģļ¼┤ņŚÉ ļīĆĒĢ┤ Ļ░£ņäĀņØ┤ ĒĢäņÜöĒĢśļŗżĻ│Ā ņØæļŗĄĒĢśņśĆĻ│Ā, ņäżļ¼ĖņĪ░ņé¼ ņāüņŚÉņä£ ĒÖĢņØĖĒĢĀ ņłś ņ׳ļŖö ņŻ╝ņÜö Ļ░£ņäĀņĀÉņ£╝ļĪ£ļŖö ļŗ©ņł£ĒĢ£ ĻĄ¼Ļ░ĢĻ▒┤Ļ░Ģ Ļ┤Ćļ”¼ļ¦īņØ┤ ņĢäļŗī ņĀĢĻĖ░ņĀüņ£╝ļĪ£ ĻĄ¼Ļ░ĢĻ▓Ćņ¦äņØä ņŗżņŗ£ĒĢśņŚ¼ ņĀäļ¼Ė ņØĖļĀźņŚÉ ņØśĒĢ£ ĻĄ¼Ļ░Ģ ļé┤ ņ¦łĒÖśņØś ņĪ░ĻĖ░ņ¦äļŗ©ņØä Ēؼļ¦ØĒĢśĻ│Ā ņ׳ņŚłļŗż. ņĀĢĻĖ░ņĀüņØĖ ĻĄ¼Ļ░ĢĻ▓Ćņ¦äņØä ĒåĄĒĢ£ ĻĄ¼Ļ░Ģ ņ¦łĒÖśņØś ņśłļ░®ņØĆ ĻĄ¼Ļ░Ģ Ļ▒┤Ļ░ĢņØś ņĢģĒÖöļź╝ ļŖ”ņČöņ¢┤ ņĄ£ņóģņĀüņ£╝ļĪ£ Ļ░äĒśĖņØĖņØś ĻĄ¼Ļ░Ģ Ļ┤Ćļ”¼ļź╝ ņÜ®ņØ┤ĒĢśĻ▓ī ĒĢĀ Ļ▓āņØ┤ļ»ĆļĪ£, Ēśäņ×¼ņØś ļåÆņØĆ ĻĄ¼Ļ░ĢĻ┤Ćļ”¼ ņŚģļ¼┤ņØś Ēö╝ļĪ£ļÅäļź╝ ņżäņØ╝ ņłś ņ׳ļŖö Ļ░£ņäĀņĀÉņØ┤ ļÉĀ Ļ▓āņØ┤ļŗż. ņØ┤ļź╝ ņ£äĒĢśņŚ¼ļŖö ņÜöņ¢æņŗ£ņäż ļé┤ ņĀäļŗ┤ ņ╣śĻ│╝ņØśņé¼Ļ░Ć ļ░░ņ╣śļÉśņ¢┤ ņĀĢĻĖ░ņĀüņØĖ Ļ▓Ćņ¦äņØä ņŗ£Ē¢ēĒĢśņŚ¼ņĢ╝ ĒĢĀ Ļ▓āņØ┤ļéś, Ē¢ēņĀĢņØĖ ņäżļ¼ĖņĪ░ņé¼ņŚÉņä£ļŖö ņĀĢĻĖ░ņĀüņØĖ ĻĄ¼Ļ░ĢĻ▓Ćņ¦äņØś ņżæņÜöļÅäĻ░Ć ņĀ£ņØ╝ ļé«Ļ▓ī ĒÅēĻ░ĆļÉ£ ļ¦īĒü╝ Ļ░äĒśĖņØĖĻ│╝ Ē¢ēņĀĢņØĖ Ļ░ä ņØĖņŗØņØś Ļ░äĻĘ╣ņØä ņżäņØ┤Ļ│Ā ĒĢ®ņØśņĀÉņØä ļÅäņČ£ĒĢśļŖö ļŹ░ņŚÉļÅä ļģĖļĀźņØä ĻĖ░ņÜĖņŚ¼ņĢ╝ ĒĢĀ Ļ▓āņØ┤ļŗż.
ņĀäļ░śņĀüņØĖ ņäżļ¼ĖņĪ░ņé¼ņŚÉņä£ļŖö Ē¢ēņĀĢņØĖņŚÉ ļīĆĒĢ£ ĻĄ¼Ļ░Ģļ│┤Ļ▒┤ĻĄÉņ£ĪņØś ņżæņÜöļÅäļź╝ ļé«Ļ▓ī ĒÅēĻ░ĆĒĢśĻ│Ā ņ׳ņŚłņ£╝ļéś, ļ│Ė ņŚ░ĻĄ¼ņŚÉņä£ ņāüļīĆņĀüņ£╝ļĪ£ Ē¢ēņĀĢņØĖņØś ļ╣äņżæņØ┤ Ļ░äĒśĖņØĖļ│┤ļŗż ņĀüņØĆ ņĀÉ, Ē¢ēņĀĢņØĖ ļé┤ņŚÉņä£ļŖö Ē¢ēņĀĢņØĖņŚÉ ļīĆĒĢ£ ĻĄ¼Ļ░Ģļ│┤Ļ▒┤ĻĄÉņ£ĪņØś ĒĢäņÜöņä▒ņØä ļåÆĻ▓ī ĒÅēĻ░ĆĒĢ£ ņĀÉņØä Ļ│ĀļĀżĒĢśņśĆņØä ļĢī ņČöĒøä ļŹö Ļ┤æļ▓öņ£äĒĢ£ ņŚ░ĻĄ¼Ļ░Ć ņ¦äĒ¢ēļÉ£ļŗżļ®┤ ņżæņÜöļÅäņŚÉ ļīĆĒĢ£ Ļ░ĆņżæņØ┤ ļŗ¼ļØ╝ņ¦ł Ļ░ĆļŖźņä▒ņØ┤ ņ׳ļŗż.
ļ│Ė ņŚ░ĻĄ¼ņØś ĒĢ£Ļ│äļŖö ņÜöņ¢æņŗ£ņäż ņĀäņ▓┤Ļ░Ć ņĢäļŗī ņØ╝ļČĆļ¦īņØä ļīĆņāüņ£╝ļĪ£ Ē¢łĻĖ░ ļĢīļ¼ĖņŚÉ ĒÄĖņżæļÉ£ Ēæ£ļ│ĖņŚÉ ņØśĒĢ£ ĒåĄĻ│äņĀü ņśżļźśĻ░Ć ļ░£ņāØĒĢĀ ņłś ņ׳ļŗż. ļśÉĒĢ£ Ļ░äĒśĖņØĖņØś ĻĘ╝ļ¼┤ Ēö╝ļĪ£ļÅä ņĪ░ņé¼ņŚÉ ņ׳ņ¢┤ņä£ ņŻ╝Ļ┤ĆņĀüņØĖ Ēö╝ļĪ£ļÅäĻ│╝ ļŗ©ņł£Ē׳ Ļ┤Ćļ”¼ ņØĖņøÉņłśļ¦īņØä ļ╣äĻĄÉĒĢśņśĆĻĖ░ ļĢīļ¼ĖņŚÉ, Ļ┤Ćļ”¼ĒĢśļŖö ĒÖśņ×ÉņØś ņ×ÉĻ░ĆņāØĒÖ£ļŖźļĀź ņĀĢļÅäņŚÉ ļö░ļźĖ Ļ░äĒśĖņØĖņØś ĻĘ╝ļ¼┤ Ēö╝ļĪ£ļÅä ņ░©ņØ┤ļź╝ ĻĘ£ļ¬ģĒĢśņ¦Ć ļ¬╗ĒĢśņśĆļŗż. ņØ┤ļŖö ļ│Ė ņŚ░ĻĄ¼ņŚÉņä£ ĒÖśņ×ÉņÖĆ ņĀäļŗ┤ Ļ░äĒśĖņØĖņØä 1:1ļĪ£ ļ¦żņ╣ŁĒĢśņ¦Ć ņĢŖņĢśĻĖ░ ļĢīļ¼ĖņØ┤ļ®░, ņČöĒøä ļŹö Ļ┤æļ▓öņ£äĒĢ£ ņŚ░ĻĄ¼ļź╝ Ļ│äĒÜŹĒĢĀ ņŗ£ ņ░ĖĻ│ĀĒĢĀ ņłś ņ׳ņØä Ļ▓āņØ┤ļŗż.
Ōģż. Ļ▓░ļĪĀ
ĒśäļīĆ ņé¼ĒÜīņØś Ļ│ĀļĀ╣ĒÖö Ļ▓ĮĒ¢źņŚÉ ļ¦×ņČöņ¢┤ ļģĖņØĖ ņÜöņ¢æņä£ļ╣äņŖż Ļ│ĄĻĖēņØä ņ£äĒĢ£ ņÜöņ¢æņøÉ ļō▒ ņÜöņ¢æņŗ£ņäżņØś ņłśļŖö Ļ░ĆĒīīļź┤Ļ▓ī ņ”ØĻ░ĆĒĢśĻ│Ā ņ׳ņ£╝ļéś, ņÜöņ¢æņä£ļ╣äņŖż Ļ│ĄĻĖēņØä ņ£äĒĢ£ ņÜöņ¢æļ│┤ĒśĖņé¼ņØś ņłśļŖö ļģĖņØĖ ņØĖĻĄ¼ļéś ļģĖņØĖ ņÜöņ¢æņŗ£ņäżņØś Ļ░ĆĒīīļźĖ ņ”ØĻ░Ć ņČöņäĖļź╝ ļö░ļØ╝Ļ░Ćņ¦Ć ļ¬╗ĒĢśļŖö ņŗżņĀĢņ£╝ļĪ£, ņÜöņ¢æ ņä£ļ╣äņŖżņØś ņłśņÜöņŚÉ ļ╣äĒĢ┤ Ļ│ĄĻĖēņØ┤ ļČĆņĪ▒ĒĢ£ ņāüĒÖ®ņØ┤ļŗż. ļö░ļØ╝ņä£ ņÜöņ¢æļ│┤ĒśĖņé¼ļōżņØś ņŚģļ¼┤ ĒĢśņżæņØ┤ ņĀÉņ░© ņ”ØĻ░ĆĒĢśļ”¼ļØ╝ ņśłĻ▓¼ļÉśļŖö Ļ░ĆņÜ┤ļŹ░, ņÜöņ¢æņŗ£ņäżņŚÉņä£ ņżæņÜöĒĢśĻ▓ī Ļ│ĀļĀżļÉśņ¢┤ņĢ╝ ĒĢśļŖö ĻĄ¼Ļ░ĢĻ┤Ćļ”¼ņŚÉ ļīĆĒĢ£ ņÜöņ¢æļ│┤ĒśĖņé¼ļōżņØś ņØĖņŗØņØĆ ņøÉĒÖ£ĒĢśĻ▓ī ņĪ░ņé¼ļÉ£ ļ░ö ņŚåņŚłļŗż. ļö░ļØ╝ņä£ ļ│Ė ņŚ░ĻĄ¼ņŚÉņä£ļŖö ņÜöņ¢æņŗ£ņäż ļé┤ ņÜöņ¢æļ│┤ņåīņé¼ļź╝ ĒżĒĢ©ĒĢ£ Ļ░äĒśĖņØĖļōżņØś ĻĄ¼Ļ░Ģ Ļ┤Ćļ”¼ Ļ┤ĆļĀ© ņŚģļ¼┤ Ļ░ĢļÅäļź╝ ņĪ░ņé¼ĒĢśņśĆĻ│Ā, Ļ░äĒśĖņØĖļōżņØś ĻĄÉņ£Ī ĒśäĒÖ®Ļ│╝ ņÜöņ¢æņä£ļ╣äņŖż ļ░£ņĀäņØä ņ£äĒĢ┤ Ļ░äĒśĖņØĖļōżņØ┤ ņøÉĒĢśļŖö Ļ▓āņØ┤ ļ¼┤ņŚćņØĖņ¦Ćļź╝ ĒÅēĻ░ĆĒĢśņśĆļŗż. ļśÉĒĢ£ ņÜöņ¢æņŗ£ņäż ļé┤ ĒÖśņ×ÉļōżņØś ņ×ÉĻ░ĆĻ┤Ćļ”¼ ļŖźļĀź ĒśäĒÖ®Ļ│╝ ņØ┤ņÖĆ ņŚ░Ļ┤Ćņä▒ņØä Ļ░Ćņ¦ĆļŖö ņÜöņåīļź╝ ļČäņäØĒĢśņŚ¼ Ļ░äĒśĖņØĖļōżņØś ĒÖśņ×É Ļ┤Ćļ”¼ ņÜ®ņØ┤ņä▒ņØä ļåÆņØ┤Ļ│Āņ×É ĒĢśņśĆļŗż.
ļ│Ė ņŚ░ĻĄ¼ņŚÉņä£ļŖö ļģĖņØĖ ņןĻĖ░ ņÜöņ¢æņŗ£ņäż ļé┤ Ļ░äĒśĖņØĖĻ│╝ Ē¢ēņĀĢņØĖņØä ļīĆņāüņ£╝ļĪ£ ĒÖśņ×É ĻĄ¼Ļ░ĢĻ┤Ćļ”¼ņÖĆ Ļ┤ĆļĀ©ļÉ£ ņäżļ¼ĖņĪ░ņé¼ļź╝ ņŗ£Ē¢ēĒĢśņśĆņ£╝ļ®░, ņÜöņ¢æņŗ£ņäż ļé┤ ņ×ģņøÉĒÖśņ×Éļź╝ ļīĆņāüņ£╝ļĪ£ ļīĆĒÖöĻ░ĆļŖź, ļ│┤Ē¢ēĻ░ĆļŖź, ņ×ÉĻ░Ć ĻĄ¼Ļ░ĢĻ┤Ćļ”¼ Ļ░ĆļŖźņŚ¼ļČĆļź╝ ņĪ░ņé¼ĒĢśņśĆļŗż.
ņØ┤ļ¤¼ĒĢ£ ļé┤ņÜ®ņØä ņĀĢļ”¼ĒĢ£ Ļ▓░Ļ│╝ļŖö ļŗżņØīĻ│╝ Ļ░Öļŗż.
1. ļīĆļČĆļČäņØś Ļ░äĒśĖņØĖļōżņØĆ ĒÖśņ×É ĻĄ¼Ļ░ĢĻ┤Ćļ”¼ļź╝ ņŗ£Ē¢ēĒĢśĻ│Ā ņ׳ņŚłņ£╝ļ®░, ĻĄ¼Ļ░ĢĻ┤Ćļ”¼ ņŚģļ¼┤ņŚÉ ļīĆĒĢ£ ļ¦īņĪ▒ļÅäļŖö ļåÆņØĆ ĒÄĖņØ┤ņŚłņ£╝ļéś ļÅÖņŗ£ņŚÉ ņŚģļ¼┤ Ēö╝ļĪ£ļÅä ļ░Å ņŚģļ¼┤ Ļ░£ņäĀ ĒĢäņÜöņä▒ļÅä ļåÆĻ▓ī ĒÅēĻ░ĆļÉśņŚłļŗż. ļśÉĒĢ£ ņĀĢĻĖ░ņĀüņØĖ ĻĄ¼Ļ░ĢĻ┤Ćļ”¼ ĻĄÉņ£ĪņØä ņłśļŻīĒĢśĻ│Ā ņ׳ļŖö ņØĖņøÉ ņŚŁņŗ£ ņĀüņØĆ ĒÄĖņØ┤ņŚłļŗż.
2. ņŚģļ¼┤ Ļ░£ņäĀņØä ņ£äĒĢśņŚ¼ Ļ░äĒśĖņØĖļōżņØĆ ņĀäļ¼Ė ņØĖļĀźņŚÉ ņØśĒĢ£ ņÜöņ¢æņŗ£ņäż ļé┤ņŚÉņä£ņØś ņĀĢĻĖ░ņĀü ĻĄ¼Ļ░ĢĻ┤Ćļ”¼ ĒĢäņÜöņä▒ņØä ļåÆĻ▓ī ĒÅēĻ░ĆĒĢśņśĆņ£╝ļ®░, Ļ░äĒśĖņØĖņŚÉ ļīĆĒĢ£ ĻĄ¼Ļ░Ģļ│┤Ļ▒┤ĻĄÉņ£Ī ņŗ£Ē¢ēņØ┤ ĻĘĖ ļÆżļź╝ ņØ┤ņŚłļŗż. ņØ┤ļŖö Ē¢ēņĀĢņØĖņØś Ļ▓░Ļ│╝ņÖĆļŖö ņāüļ░śļÉśņŚłļŖöļŹ░, Ē¢ēņĀĢņØĖļōżņØĆ Ē¢ēņĀĢņØĖņŚÉ ļīĆĒĢ£ ĻĄ¼Ļ░Ģļ│┤Ļ▒┤ĻĄÉņ£Ī ņŗ£Ē¢ēņØ┤ ņżæņÜöĒĢśļŗżĻ│Ā ĒÅēĻ░ĆĒĢśņśĆĻ│Ā, ņÜöņ¢æņŗ£ņäż ļé┤ņŚÉņä£ņØś ņĀĢĻĖ░ņĀü ĻĄ¼Ļ░ĢĻ┤Ćļ”¼ļŖö Ļ░Ćņן ņżæņÜöĒĢśņ¦Ć ņĢŖļŗżĻ│Ā ĒÅēĻ░ĆĒĢśņśĆļŗż.
3. ņÜöņ¢æņŗ£ņäż ļé┤ Ļ░äĒśĖņØĖļōżņØĆ ĻĄ¼Ļ░ĢĻ┤Ćļ”¼ ņŚģļ¼┤ļź╝ ņĀüĻĘ╣ ņłśĒ¢ēĒĢśĻ│Ā ņ׳ņŚłņ£╝ļéś, ĻĘĖ ņŚģļ¼┤ Ļ░ĢļÅäņŚÉ ņ׳ņ¢┤ ļ¦ÄņØĆ Ēö╝ļĪ£Ļ░ÉņØä ĒśĖņåīĒĢśņśĆĻ│Ā Ļ░£ņäĀ ĒĢäņÜöņä▒ņØä ļŖÉļü╝Ļ│Ā ņ׳ņŚłļŗż. ņØ┤ļź╝ ņ£äĒĢśņŚ¼ļŖö ņÜöņ¢æņŗ£ņäż ņ╣śĻ│╝ņØśņé¼ņØś ĒÖĢņČ® ļō▒ ņŚģļ¼┤ņØś ņĀäļ¼Ėņä▒ņØä Ē¢źņāüņŗ£ĒéżĻ│Ā ļÅÖņŗ£ņŚÉ Ļ░äĒśĖņØĖņŚÉĻ▓ī ņ¦æņżæļÉ£ ņŚģļ¼┤ ĒĢśņżæņØä ņżäņØ┤ĻĖ░ ņ£äĒĢ£ ņĀ£ļÅäņĀü ļÆĘļ░øņ╣©Ļ│╝ ļŹöļČłņ¢┤, Ļ░äĒśĖņØĖĻ│╝ Ē¢ēņĀĢņØĖ Ļ░ä ņØśĻ▓¼ņØś Ļ░äĻĘ╣ņØä ļ®öņÜ░ĻĖ░ ņ£äĒĢ£ ņĪ░ņ£©ņØ┤ ĒĢäņłśņĀüņØ╝ Ļ▓āņØ┤ļŗ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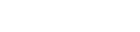
 PDF Links
PDF Links PubReader
PubReader ePub Link
ePub Link Full text via DOI
Full text via DOI Download Citation
Download Citation Print
Print


